
인간이 자연에 대해 우위에 서는 데는 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은 특히 도구의 비약적인 발달을 가져왔고, 이는 수렵과 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먹는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도구를 만들기 위해 금속을 녹이는 일을 맡은 건 숯이었다. 숯은 철기시대 이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600년 전부터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차 금속을 녹이는 기능을 넘어 밥을 하고 방을 데우는 데도 활용됐다. 온돌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땔나무와 숯을 보관하는 창고까지 집집마다 생겼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헌강왕 때 경주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밥을 할 때 나무를 때지 않고 숯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신라 말기 경주의 10만호가 모두 숯으로 밥을 해 먹는 바람에 질식할 정도였다고 하니 숯가마와 함께 다량의 숯 유물이 경주에서 발견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조상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숯을 먹는 음식에까지 이용했다. 숯 1g의 표면적은 약 300㎡로 거기에 셀 수 없이 많은 구멍을 갖고 있다. 이 구멍들이 각종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파악한 것이다.
우물을 팔 때는 잘 씻은 숯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자갈을 얹었다. 숯은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물에 포함된 흙 성분은 물론 미세한 이물질까지 고스란히 제몸에 남기는 정수기 역할을 했다. 일년에 한번씩 마을 우물을 청소할 때는 반드시 숯을 갈았다.
장을 담글 때 숯을 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빈 독에 연기가 나는 숯을 넣고 그 속에서 장을 발효시키면 나쁜 균을 없애고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해 장맛을 좋게 한다. 또 숯에는 탄소와 미네랄이 풍부해 된장이나 간장의 영양가를 높여 준다.
동아시아에서는 예부터 숯을 약으로도 사용했다. 위궤양, 대장염, 변비 등 위나 장이 좋지 않은 환자는 숯가루를 물에 타 마시게 했다. 숯이 체내의 유독물질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상처 부위에 숯가루를 붙이면 독성을 빨아들이고 염증을 제거하는 기능도 한다.
찹쌀가루에 숯가루를 섞어 거르고 쪄서 절구질을 한 뒤 꿀이나 기름을 발라먹는 숯떡도 전해온다. 이 역시 체내의 독성을 빨아들이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숙변을 제거하는 등의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숯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조리과정에 숯을 넣거나 식용으로 섭취할 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의약품 또는 식품의 여과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숯은 물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조상들은 방의 공기를 맑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장실이나 창고 등 냄새가 나고 세균이 많은 곳에도 숯을 둬 청결히 하는 데 사용했다.
습도가 높은 곳에 숯가루를 두면 습기를 적절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할 때 숯을 묻었다. 800년 가까이 변함없이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각 지하에는 많은 숯과 소금이 묻혀 있다고 한다. 숯을 깔면서 소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기초를 다짐으로써 습도를 이상적으로 맞춘 것이다.
숯에 새집증후군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것도 이 같은 기능 때문이다. 페인트나 마감재, 새 가구나 비닐제품 등에서 뿜어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숯에 흡착됨으로써 두통이나 피부염 등의 원인 요소가 제거되는 것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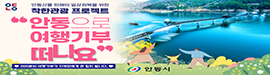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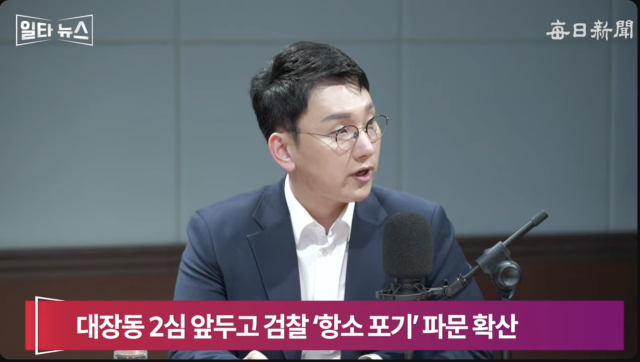
![[단독]](https://www.imaeil.com/photos/2025/11/17/20251117203707121763379427_l.jpg)























댓글 많은 뉴스
[기고-김성열]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면 답하라
"항소포기로 7천800억원 날아가"…국힘, 국정조사 촉구
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못해"
[화요초대석-김영수]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5%…'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3주 만에 하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