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들이 더러 있다. 음울하고 누추한 시대의 성자, 강물 위에 수군대는 별빛, 낯선 주막거리에 내걸린 주(酒)자 등불 등이 빛나는 것들이다.
나의 지난날은 어둠의 터널 속 궁핍과 허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남루가 웃음까지 앗아가지는 않았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웃음소리가 호박을 업고 있는 낮은 돌담을 넘어 자주 고샅에 깔렸다.
답사팀들이 고향집을 보면 정면 삼 칸 측면 단 칸의 초옥이라 말하지만 실은 툇마루도 없는 방 두 개짜리 초가일 뿐이다. 동쪽엔 문 없는 별채 변소가 있었고 서쪽 담 밑에는 횟대가 높은 닭장이 있었으니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었다.
농사일로 골몰하시는 어머니는 저녁 숟가락 놓기 무섭게 곯아떨어지셨다. 다섯 아이들은 밤마다 호롱불을 먼저 차지하려고 싸움질을 했다. 누나 중 어느 누가 양초 동가리를 구해 와 불을 켜는 날은 헬렌 켈러가 한 삼일쯤 눈을 뜨고 밝은 날을 보는 것처럼 너무 밝아 눈이 부셨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이 더욱 그리워질지는 몰라도 나는 양초 불빛 밝았던 푸르른 그 밤이 한없이 그립다.
##초당에 모여 새끼 꼬고 닭서리 나서
농촌의 겨울은 일이 없다. 어른들은 초당에 모여 새끼를 꼬고 청년들은 긴 겨울밤을 즐길 요량으로 닭서리에 나선다. 닭을 붙잡아 재 한 바가지를 덮어씌우면 꼬꼬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숨이 막혀 죽는다는 소문이 돌자 부엌의 재가 남아나지 않았다.
눈 오는 밤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웃집 지붕들은 그렇게 먹고 싶었던 하얀 앙꼬빵을 엎어놓은 것처럼 소담스럽다. 겨울밤에 '무엇이 먹고 싶다'는 생각은 마왕(魔王)의 수작이다. 식욕이라는 음식을 향한 그리움이 발작을 하게 되면 색욕(色慾) 수욕(睡慾)은 저리 가라다.
##지붕위 쌓인 눈 쓸어내리는 작전
곤하게 주무시던 어머니의 "밖에 눈 오나 봐라"는 말 한마디는 바로 비상을 알리는 종소리다. 잠결에 서까래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우지끈'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모양이다. 과부가족 분대원들은 바로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는 작전에 돌입해야 한다. 서까래가 부러지면 눈더미가 방안으로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누나 셋을 제치고 장남인 내가 사다리에 반쯤 올라가 긴 대나무 장대로 돌아가면서 눈을 털어 내린다. 마당에 떨어진 눈을 치우면서 어머니는 "우리 아들 잘한다."고 연방 응원을 보낸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더니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눈 내리는 밤 지붕 위에 잔뜩 쌓인 눈을 힘든 줄 모르고 끌어내리게 만들다니.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배가 고팠다. "담 밑 무 구덩이에 묻어 둔 무라도 몇 개 깎아 묵업시더." 어머니는 단번에 "그래라"고 하셨다. 그 무는 초봄 나박김치용으로 저장해 둔 것인데…….
이번에는 괭이와 삽을 들고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구덩이 입구를 막아 둔 볏짚 마개까지 빼냈는데 팔이 짧아 손이 닿지 않았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부엌칼을 들이밀어 보니 길이가 제대로 맞았는지 무가 찔려 나왔다. 두 번째 전투도 승리였다.
##괭이'삽 들고 언 땅 파기 시작
깊은 구덩이 속에 묻혀 있던 무는 정말 싱싱했다. 푸른 부분 쪽부터 한입 먹어보니 얼마나 시원하고 맛이 있던지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것들이 별빛과 등불만은 아닌 것 같다.
눈 오는 그날 밤에 먹었던 눈 구덩이 속의 생무도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분명했다. 무 한 조각의 감동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남아 지금도 내 마음의 벽면 높은 곳에 '어둠 속의 판화'처럼 걸려 있다. 그 판화의 제목은 '그리움'이었다.
수필가 9hwal@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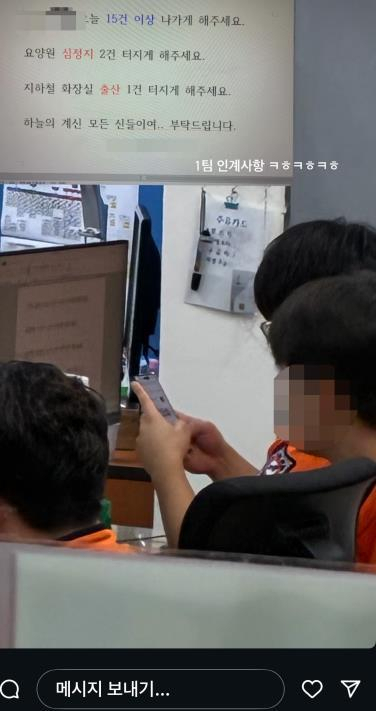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