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어는 서민의 생선이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넉넉한 살, 담백한 맛까지 더했으니 힘겨운 살림살이에는 참으로 고마운 생선이다. 특히 소금에 적당히 절인 간고등어는 시렁에 얹어 두고 한 도막씩 꺼내 굽고 지져 먹어도 상하지 않는 생명력까지 갖췄으니 한 손 사면 오래 밥상의 풍성함을 안겨줬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간고등어는 더 반가운 먹을거리였다.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하기 어려운 안동 같은 곳에서는 간고등어가 고급 반찬이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혼례, 상제, 생일이나 회갑잔치 등 중요한 상에는 빠지지 않았다.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변질되기 전에 싣고 가기도 힘든 내륙 안동이 간고등어로 유명해진 데는 이런 서민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 수백 년 내려온 안동 간고등어 맛의 비결을 알기 위해 제조 공장을 찾았다.
◆개인 위생부터 철저히
㈜안동간고등어 공장은 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 가까이 있다. 원재료인 냉동 고등어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실어오는 편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돼 곳곳으로 배송해야 할 물량이 많아진 점도 공장 입지에 영향을 미쳤다.
공장에 들어서서 수인사를 하고 나니 조정연 홍보팀장이 옷부터 내밀었다. 위생복쯤으로 생각했는데 펼쳐 보니 하얀 한복 저고리와 바지에 패랭이였다. 일반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지만 고등어에 간을 하는 간잽이는 전통 복장을 입는다는 것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은 뒤 작업장에 들어가려는데 입구가 심상찮았다. 시키는 대로 밀폐된 유리벽 안에 섰더니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뿜어졌다. 몸에 붙은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곳이었다. 작업장 역시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다. 수천마리의 고등어가 여러 공정에 걸쳐 가공되고 있는데도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았다.
올해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기 위해 설비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설명이 이해됐다. HACCP은 최종 제품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증하는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다. 고등어 같은 생물을 가공하는 공정이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층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동-염장-숙성 과정에 맛 결정
간고등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고등어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소금을 뿌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선입견은 작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거치는 공정만 10단계였고, 모두 규격화돼 있었다.
우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실려 온 냉동 고등어는 저온에서 20시간에 걸쳐 해동(解凍)한다. 얼었던 고기가 갑자기 녹으면 육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천천히 녹인다. 거의 녹은 고등어는 상온의 흐르는 물에서 20분 이상 해동을 더 한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깨끗이 씻고 염도 5% 정도의 소금물에 넣어 2시간 정도 둔다. 습식 염장(鹽藏) 단계다. 바닷물과 비슷한 환경을 만난 고등어는 신비하게도 등의 푸른색과 윤기를 되찾는다.
물을 뺀 고등어에 소금을 치는 건식 염장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 소금을 얼마나 골고루 뿌려주느냐에 따라 고등어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간잽이가 어물전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자리였으니 단순한 소금 뿌리기 작업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염장을 거친 고등어는 영하 3℃의 숙성고에 들어간다. 무게에 따라 22~24시간 숙성시켜 소금간이 적절히 배게 한 뒤 진공으로 비닐포장된다. 마지막으로 금속탐지기를 거쳐 이물질이 없는 게 확인돼야 박스에 포장돼 판매점이나 가정으로 배달된다.
◆50년 간잽이의 신명
기자의 체험은 50년 간잽이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이동삼(69) 대표이사와 간잽이 기능 이수자 김우현 과장, 전수 장학생 장상도 과장이 도왔다.
해동실에서 박스로 꺼내 무더기로 상온 해동을 시키는 과정을 해본 뒤 기자의 손에 고등어 한 마리와 작은 칼이 주어졌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단계. "칼은 얕게 넣고 끝까지 같은 힘으로 밀어야 합니다. 아가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내장을 훑어낸 뒤 씻어내세요." 김 과장의 시범과 설명을 보고들은 뒤 고등어를 잡았다. 물컹 하는 느낌에 칼이 똑바로 나아가지 않았다. 공연히 힘을 쓰다 보니 칼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 10여 마리의 배를 가르고 나서야 얕게 밀리는 감이 생기는 것 같았다.
겉과 속을 몇 번이나 씻는 단계를 거친 뒤 고등어 더미를 습식 염장통에 넣고 나니 이동삼 선생이 나섰다. 가장 중요한 건식 염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소금은 얼마나 쥐고 어떤 방법으로 뿌려야 합니까?" "그걸 말로 어찌하나. 고등어 크기를 보고 한 움큼 잡아 휙 뿌리는 거지." 눈으로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었다.
"아가미를 잡고 왼쪽으로 좍 벌려요." 한발 떨어진 곳에서 기자가 잡고 있는 고등어에 소금이 날아왔다. 소금은 아가미 아래에서 꼬리 위까지 똑같은 양이 뿌려졌다. 얼핏 봐도 단위면적당 소금 개수를 세면 하나도 다르지 않을 정도였다.
기자에게 소금을 뿌려보라고 한 이 선생은 추임새처럼 말을 던졌다. "아가미 잡아 쭉 벌리고" "소금 쥐고 한번에 좍" "왼손에 힘 주고 오른손엔 힘 빼고" "먹을 사람 생각하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넣는다고 생각해" 스무살 너머부터 50년 가까이 간잽이를 해온 그의 신명이 기자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졌다.
소금을 뿌린 고등어를 숙성고에 넣은 뒤 포장까지 해본 기자에게 김 과장이 금속탐지기를 가리켰다. '고등어가 금속을 먹기라도 하나'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자에게 김 과장이 설명했다. "낚시바늘이나 냉동포장 박스에 있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수없이 거치지만 마지막에는 기계로 검사해야 식품 안전이 최종 확인되는 거죠."
◆안동간고등어 맛의 비결
1998년 매일신문의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이듬해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을 계기로 상품화가 시작된 안동간고등어는 이동삼 간잽이를 공장장으로 영입한 뒤 공정 규격화와 위생 관리에 주력했다. 그 결과 6년 연속 TV홈쇼핑 식품 부문 판매 1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 브랜드 대상' 등 실속과 명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체험을 마친 뒤 이동삼 선생과 마주앉았다. 체험하면서 얼핏 이해됐지만 안동 간고등어가 독특한 맛을 내는 이유를 더 상세히 듣고 싶어서였다. "일단 원재료가 좋아야 맛이 좋아요. 고기는 최상품을 써야 하고, 소금도 최고급 천일염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뿐일까. 의문을 던졌더니 이 선생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군에서 제대해 1965년 어물전에서 다시 일을 할 때 간잽이가 세명 있었는데 모두 환갑이 넘었어요. 아무도 간잽이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며가며 어깨너머로 본 뒤 한밤중에 혼자 고등어 배를 가르고 간잽이 흉내를 내봤죠. 칼에 손을 베이고 찬물에 동상 걸리기를 몇년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고등어의 사전 숙성도와 소금의 양, 사후 숙성 등 간잽이의 역할에 따라 간고등어 맛은 천차만별이 된다고 했다. "생선은 뭐든 싱싱할 때 간을 하면 맛이 덜합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배에서 간을 하는 게 좋다고도 하는데 고등어는 60% 정도 숨이 죽었을 때 간을 하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안동 간고등어의 유래를 짚어보면 의미가 와닿는다. 옛 상인들은 영덕 강구항에서 동틀 무렵 출발해 달구지로, 등짐으로 싣고 온 고등어를 날이 저물어 도착한 임동 챗거리 장터에서 배를 갈라 소금을 뿌려 두면, 안동에 도착할 때쯤 잘 숙성돼 제맛을 낸다는 사실을 알았다. 10단계의 현 제조 공정은 옛 상인들의 간고등어 만드는 지혜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제맛이 나지 않으면 내놓지 않는다'는 이동삼 간잽이의 평생 철학, 과학과 위생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것이 요즘 안동 간고등어의 맛인 셈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사진·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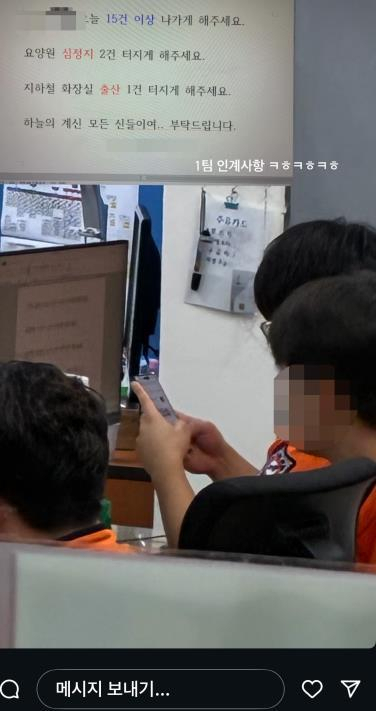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