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바다를 숭배하진 않지만
위에 계신 그 분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 자주 한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것과
그 오랜 세월 묵묵부답이 매번 응답인 것도
흡사하다 뒷골목 같은 내 사랑은
시도 때도 없이 파랑 치는데
사랑 따윈 철 지난 이데올로기쯤으로 취급하는 것도
틈이라곤 없어 보이는 것도 닮았다
그러고 보니 내 불평과 서운함이 오래된 만큼
저 바다도 참 많이 늙었다
기름 냄새 흉흉한 송도 부두 지날 때
듬성듬성한 외진 솔밭 길 지날 때
조금은 눈치 챘지만 막상 가까이서 보니
허둥허둥 벌써 또 멀다 아득하다
전에는 늘 내가 먼저 등 돌렸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저 노구의 등을 본다
시인은 "바다를 숭배하진 않지만/ 위에 계신 그 분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단다. 열거한 닮음의 이유들이 꽤 그럴 듯하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오랜 세월 묵묵부답이 매번 응답인 것도/ 흡사하다"고 한다. 삶이란 게 일테면 "시도 때도 없이 파랑 치는" 것일진대, 바다는 저 '꽉 다문 입'으로 도무지 "틈이라곤 없어 보이"니 말이다. 그러니 "불평과 서운함"도 아주 오래 묵은 것일 수밖에 없을 터. 하지만 시인은 "오늘에야 비로소 저 노구의 등을" 보게 됨으로써 이윽고 "어떤 화해"에 도달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화해란, 사랑과 열정을 질료로 한다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더 깊고 크면서도 진실한 법이다. 또 이런 화해란 상당한 세월과 연륜을 담보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마음의 경지'라 할 만하다. 아마 이즈음엔 하느님도 저 바다처럼 뒷모습이 많이 늙으셨을 게다. 어느 날 폭삭 늙어버린 부모님의 "저 노구의 등"을 우리가 문득 보게 되듯 말이다.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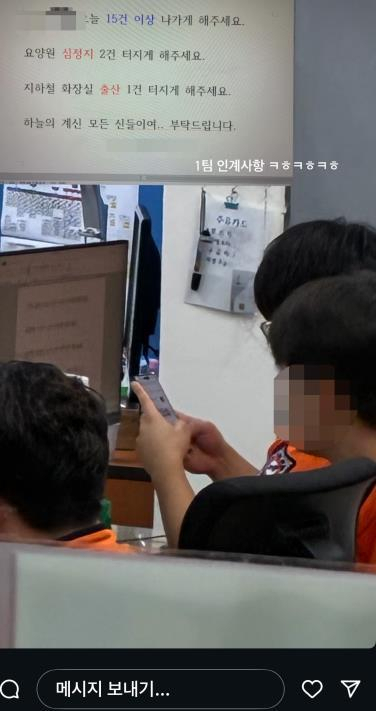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