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 8월, 조선인 강제 징용의 현장을 찾아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취재한 적이 있다. 이때 조총련 소속 재일 조선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민단 소속 재일 한국인 2, 3세는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반면, 이들은 우리말에 능숙했기 때문이다. 특히 홋카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일일이 길 안내를 하며 통역까지 해주었던 70대 조선인을 잊을 수 없다. 취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는 '재일교포' 대신 '재일동포'로 불러달라고 넌지시 주문했다.
당시 민단 소속 재일 한국인들은 '재일교포'란 말을 주로 쓴 반면, 조총련 소속 재일 조선인들은 '재일동포'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마음에 담지 않고 무심히 넘겼다. 그 '늙은 동포'의 말을 새삼 되살린 건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북한 축구대표팀의 정대세 선수 때문이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곡절 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팀 선수가 된 정 선수는 그저 일본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 '자이니치'(在日)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한국인도 조선인도, 재일교포도 재일동포도 아니라는 것이다.
남과 북이 구분해 사용한 '교포'(僑胞)와 '동포'(同胞)의 차이는 무엇일까? '교'(僑)자는 더부살이를 하거나 임시 거처 등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뜨내기란 뜻을 지녔다. 따라서 교포는 이처럼 그 어원에 멸시의 뜻을 담고 있어 쓰기를 꺼리는 사람이 적잖다. 고국을 등지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새 나라에 당당히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반면 동포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자매, 즉 어디에 살건 동일한 민족의식을 가진 한겨레를 뜻한다.
재일동포가 재일교포로 불린 까닭은 무엇인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강제로 끌려왔거나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와 살던 조선인들은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귀국선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 땅에 남아야 했다. 이 재일동포 사회에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북한은 재일동포들을 해외 공민으로 규정하고 1957년부터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 일제강점기 만주로 이주한 이들은 함경도 등 북한 쪽 사람이 많았던 반면 일본 이주 조선인들은 남한, 특히 경상도가 고향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재일동포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이로 인해 많은 재일동포들이 고향인 남한이 아닌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면서 조총련에 가담하게 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남한은 재일 한국인들을 돌아보게 되었으나 '조총련 동포'가 아니라 '민단 쪽 교포'만이 대상이었다.
동포와 교포, 조선인과 한국인으로 갈렸던 60만 재일 한민족 사회가 '자이니치'(在日)로 통합됐다는 사실은 어찌 됐건 반갑다. 그러나 재일 한민족 사회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 온전히 치유된 게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동원돼 댐 건설 현장을 비롯해 탄광, 군수 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 무연고 유골이 일본 내 사찰과 공동묘지 곳곳에 방치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제 말 혼란기 일본 현지에서 사망한 조선인 유골을 1만 기 안팎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사망한 강제 징용자 5천600여 명의 매'화장 인허가증을 최근 일본 정부에서 넘겨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1천72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에서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
사흘 뒤 글피는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탄한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강점기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로 시작된 우리 재외동포 규모는 2008년 현재 60만 '자이니치'를 포함해 전 세계 169개국 7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한반도 인구의 약 10%이며, 중국, 인도,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다. 인구가 준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 한민족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때가 아닐까.
曺永昌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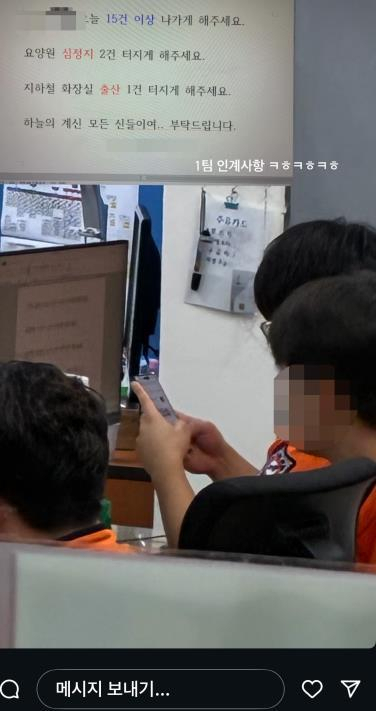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