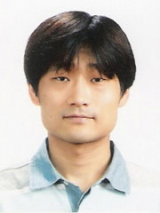
조선 후기, 열다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꼭두쇠가 돼 남사당패를 이끈 '바우덕이'라는 사람이 있다. 특히 그는 줄타기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어쩌면 필자도 그의 삶처럼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희곡은 전공자 외에는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희곡은 어느 문학 장르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있다. 독자가 아니라 관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희곡을 읽는 것이다. 이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는 희곡의 정의에도 걸맞은 것이니 아직은 희곡이 제 역할을 다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용 희곡이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각본임을 알면서도 독서용으로만 흐르는 작품 혹은 독서용이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무대화에만 치우치는 작품이다. 예를 들어 무대를 생각하지 않은 작품은 쓸데없이 독백이 많아지거나 관념적으로 흐르기 쉽고 무대화만을 고려한 작품은 감각적인 재미를 위한 볼거리에 집착하기 쉽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기란 어려워서 마치 줄타기 곡예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극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텍스트의 틀을 뚫고 나와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만날 때 또 다른 재미 혹은 더욱더 큰 창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극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활자 매체를 통해 독서의 대상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 호흡해야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 마치 문학성과 연극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는 줄타기 곡예사라고 할 수 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독자나 관객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줄 아래로 추락할 운명이다.
연극성이 부족한 작품에 대해 문학성은 뛰어나니 훌륭한 작품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튼튼한 연극성만으로 허약한 문학성을 보완할 수도 없다. 즉 문학성과 연극성 양자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 제작자와 연출가는 관객의 요구와 재미, 유행, 상업성 등을 이유로 작품 내면에 지니고 있어야 할 일종의 문학성보다 화려한 볼거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무대화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공연예술의 문화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앞서 말한 '바우덕이' 같은 뛰어난 줄타기 능력이 아닐까. 그리고 그 좋은 의미의 줄타기에는 극작가뿐 아니라 제작자, 연출가, 나아가 관객까지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이는 재미에만 치우쳐 열광하지 말고 내면의 재미 혹은 문학적 가치도 찾아 작품을 평가할 때 연극이 균형감을 갖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안 희 철 극작가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