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4년, 서울예고의 음악교사였던 한 청년이 베를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휘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무작정 독일로 향한 청년은, 베를린 음대의 라벤스타인 선생을 만나 도움을 청했다. 청년의 잠재력을 알아본 라벤스타인은 "자네가 27살에 지휘를 배운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어. 귀국해서 다시 출국수속을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여기서 입학허가를 받아 공부하게"라고 조언해 주었고, 청년은 베를린 음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갑작스럽게 체류를 결정하다 보니 입학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았던 것이다. 시험 당일, 한국에 있을 때 독일어를 조금 공부해 둔 것이 도움이 되어 이론과목은 그럭저럭 답을 채워나갔지만, 실기시험에서는 부족한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발표를 기다리던 청년은, 예상대로 불합격통지를 받자 맥이 탁 풀렸다. 크게 좌절해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그를 라벤스타인이 불러 말했다. "사람들은 자네가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을 때를 기억할 뿐, 아무도 자네가 실패했던 1974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네." 청년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베를린 음대에 청강생으로 입학,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이 청년이 바로 국내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인이자, 클래식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한국의 명지휘자 금난새이다.
그는 별칭이 많은 사람이다. 지휘자라는 본업 외에 교수, 강사, 오케스트라의 CEO 등 1인 4역을 소화해내는 아이디어맨이다. 그가 지휘봉을 잡으면 아무리 딱딱한 클래식이라도 부드럽게 녹여 청중을 매료시키는 '지휘봉의 마술사'라는 애칭을 듣는다.
'금난새', 그는 1947년 9월 25일 부산에서 출생하였으며, 가곡 '그네'를 작곡한 고 금수현(金秀賢) 선생의 둘째아들로 음악적 환경이 풍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래의 성씨는 금씨가 아닌 금녕 김(金)씨이다. 한글학회 회원이자 작곡가인 부친이 자신의 성을 한글식인 '금'으로 바꾸었다. 그 후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나는 새'라는 뜻의'금난새'로 지었고, 형제자매의 이름도 '나라' '내리' '누리' 등 'ㄴ'자 돌림으로 지었다.
지휘 실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금난새는 한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아버지 덕에 해방 이후 한국 최초로, 호적에 등재된 순수 한글식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는 두 아들의 이름도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지었다. 'ㄴ'자 다음에 'ㄷ'자를 돌림자로 사용하여 '금다다'와 '금드무니'라고 지었다. 한자에도 뜻이 있듯이, 한글이름에도 뜻이 있다. '다다'는 '모두 다' 라는 의미가 있고, '드무니'는 '드물고 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란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란 뜻인데 해석방법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의 획수(劃數)나 부수(部首)가 운명을 좌우하고, 이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용문자가 길흉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다. 한 예로 사람의 이름에 밝을 명(明)자를 사용하면 불구, 폐질, 단명한다고 했다가, 밝을 명자를 사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나니 불용문자라는 말들이 사라졌다. 사람의 이름은 부르는 것이다. 소리의 음운오행(音韻五行)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성격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www.gilnam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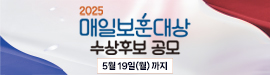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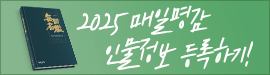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