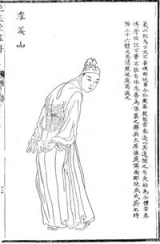
봄바람 속 흑흑 흐느껴 울었어요 이상은
여덟 살 때 몰래 거울에 비춰보며 八歲偸照鏡(팔세투조경)
이미 긴 눈썹을 잘도 그렸지요 長眉已能畵(장미이능화)
열 살 때 풀이 돋는 들판에 놀러가서 十歲去踏靑(십세거답청)
부용으로 치맛자락 만들어 입었고요 芙蓉作裙衩(부용작군차)
열두 살 때 '쟁'이라는 현악기 배운다고 十二學彈箏(십이학탄쟁)
손가락에 골무를 뺀 적이 없었지요 銀甲不曾卸(은갑부증사)
열네 살 때 엄마 뒤에 자꾸만 숨은 것은 十四藏六親(십사장육친)
시집 못 간 것을 알고 놀릴까 해서지요 懸知猶未嫁(현지유미가)
열다섯에 봄바람 속 흑흑 흐느끼며 十五泣春風(십오읍춘풍)
그네 아래에서 얼굴을 돌렸어요 背面鞦韆下(배면추천하)
*원제: 無題(무제)
사람의 생애를 나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연보와 이력서는 동서고금의 보편 양식이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시인들의 시 가운데도 이력서나 연보를 쓰듯이 생애의 중요 사실들을 나이 순서대로 열거한 시가 더러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영화를 처음 봤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차를 처음 탔고/ 중학교 졸업하던 날/ 짜장면을 첨 먹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호등을 처음 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를 첨 걸었다/ 대학교 입학하던 해/바나나를 첨 먹었다// 하지만 연애 하나는/ 열한 살 때 이미 알아/ 임고서원 은행나무,/ 그 큰 나무 뒤에 숨어/ '순애는 내꺼다' 하고/ 몰래 썼다 지웠다." 되다가 만 나의 시조 '나의 이력서'도 그와 같은 전통을 계승하는 맥락 위에 서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계열의 시들은 평면적 사실의 단순 나열이 되기가 쉽다. 그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딱딱한 이력서로 추락하고 말지만, 이점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생애의 핵심을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보일 수도 있다. 당나라의 시인 이상은(李商隱: 812~858)이 지은 위의 시가 바로 그런 경우다. 보다시피 이 작품 속에는 여덟 살 소녀가 열다섯 살 처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 무슨 압축 파일처럼 흥미진진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마지막 대목이 아닐까 싶다. 그녀는 왜 봄바람 속에서 흑흑 흐느끼며, 그네 아래 얼굴을 돌렸을까. 다시 봄은 왔는데, 아직도 시집가지 못한 것이 까닭 없이 서러워서 그랬을까? 혹시 만나기로 한 애인에게 바람을 맞았나? 아니면 짝사랑하던 남자가 정말 뜻밖에도 다른 여자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을까? 바로 이와 같은 애매모호함이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무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말은 끝났으나 시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것이다.
"산비둘기 두 마리가/ 정겨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다음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프랑스의 시인 장 콕토(1889~1963)의 '산비둘기'라는 시의 전문이다. 이 작품에서 만약 '그다음'에 일어난 일을 다 말해 버렸다면 세계의 명시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게 정말 시이기는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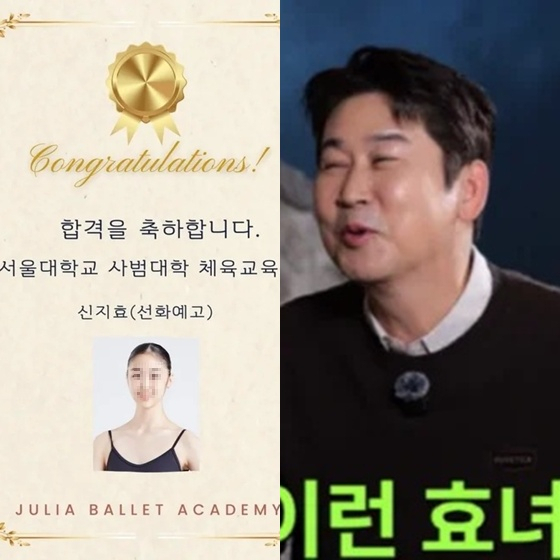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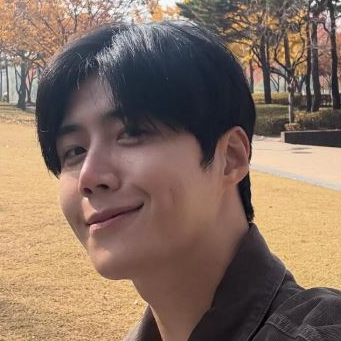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