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때 '보리 혼식'에 앞장섰다. 학교 선생님들을 시켜 도시락 검사를 하게 했고, 도시에 사는 학생들 점심 그릇에도 보리가 섞이지 않으면 그 밥을 못 먹게 할 만큼 '식량자급'에 힘썼던 적이 있다. 옳은 판단이었고, 좋은 정책이었다. 농민들과 함께 모를 내고 논둑에 앉아 밀짚모자 차림으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농촌을 살리려는 그 뜻에 감동을 받아 나는 첫 선거권을 행사할 때 박정희를 찍었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맘때쯤 어디를 둘러봐도 논과 밭에 보리가 심겨 있었다. 온 들판이 푸른 보리싹으로 물결쳤다. '보릿고개' 넘기 힘겨웠던 그 시절에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시골에서조차 보리밥을 먹는 사람이 없다. 어쩌다 먹는 사람도 '별미'로 먹는다. 식량이 남아돌아서? 아니다. 이 나라 식량 자급률은 25% 남짓이고, 잡곡 자급률은 5%대다. 아메리카합중국에서 유전자 조작이 의심되는 밀가루, 옥수수 사료, 콩을 들여오지 않으면 '식량 대란'이 일어날 판이다.
그런데도 정치가, 경제 담당자들 모두 태평이다. 주곡 농사 버리고 '특용작물'을 심으라고 야단이다. 이들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니키아뿐만 아니라 아테네제국, 로마제국도 식량 부족으로 무너져내렸다는 사실에 애써 눈감고 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식량무기'는 그 어떤 첨단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독립국을 유지하고 자주국방을 하려는 나라들은 식량자급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 정치식민이나 문화식민은 견딜 수 있어도 경제식민, 그 가운데서도 식량무기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에 '탈북'한 젊은이 한 사람이 왔던 적이 있다. 압록강 건너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서 남녘으로 온 사람이었다. 왜 탈북했느냐고 물었더니, '배가 고파서'라고 대답했다.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다. 밥을 준다고 하면 대량살상무기 공장에서라도 일해야 하고, 불량식품 공장에라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총알받이라도 해야 한다.
이 나라 남녘 사정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칠팔십이 넘도록 밭머리를 지키고 있던 시골 어르신들은 해가 다르게 노동력을 잃고 있다. 그 뒤를 이어야 할 젊은이들은 '가뭄에 콩 나기'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농촌을 이렇게 방치하고는 나라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
도시의 힘만으로는 실업문제도 비정규직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다. 하물며 '자주독립국가'나 '자주국방'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드 배치' 같은 엉터리 전쟁놀음 걷어치우고 평화에 바탕을 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일이면 너무 늦다. 지금 당장 젊은이들을 도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윤봉길 의사가 외쳤듯이 '농촌은 인류의 생명창고'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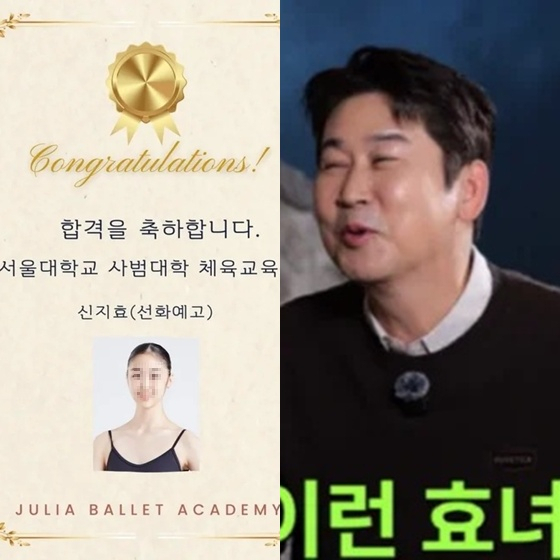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