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 1994, 1997 ~1998, 1998, 1999, 2000, 2001, 2007. 금융의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은 무엇을 뜻하는 숫자인지 알 것이다. 바로 세계 각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한 해이다. 1990년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이고 1994년은 멕시코, 1997∼1998년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998년은 러시아, 1999년은 브라질, 2000년은 아르헨티나, 2001년은 터키, 2007년은 미국(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이다.
이는 그나마 잘 알려진 사례들일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원 루크 리븐과 파비안 발렌시아가 2008년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를 포함,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경제'금융 위기는 외환 위기 208회, 금융 위기 124회, 국가 부채 위기가 63회나 됐다. 이는 금융 및 부채 위기가 습관성 질병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카르멘 라인하르트 메릴랜드대 교수가 지난 800년 동안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위기는 은행이 유럽에 처음 나타났던 13세기부터 존재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부채의 과다한 차입'이란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 호황→과도한 부채 증가→거품 붕괴와 위기'라는 동일한 경로를 밟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국가는 금융 위기의 재발이란 잘못을 범하는 것일까. 케네스 교수와 카르멘 교수의 결론은 간단하다. 정책 당국자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다. 선배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과거의 실수들에서 이미 교훈을 얻어 충분히 현명해졌다는 생각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의 호황은 기반이 건전해 과거와 다르다'는 낙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지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도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이 깊이 침투해 있는 것 같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지금까지 시도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 그 원인은 대화와 지원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소망적 사고였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에 응하는 척하면서 중유와 식량 등 반대급부를 챙긴 뒤 핵 동결 약속 파기하기를 반복해왔다. 문 대통령의 해법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소리다. 북한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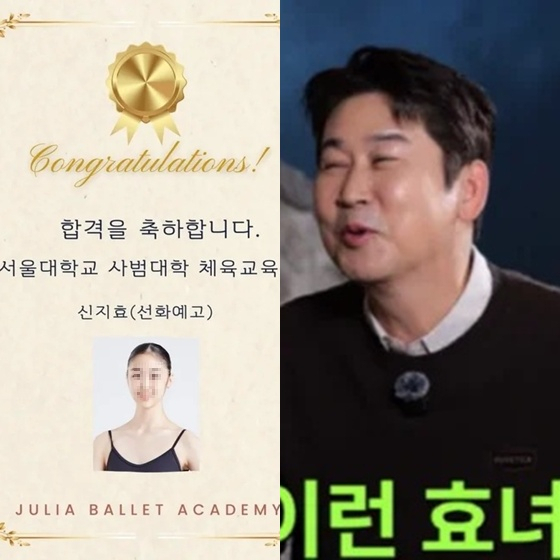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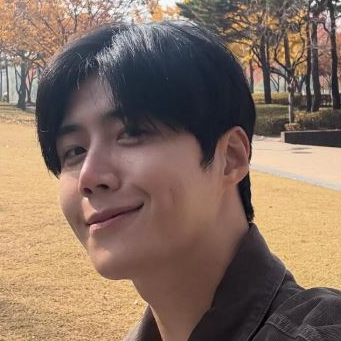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