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

장도(粧刀)는 장신구이자 부녀자의 호신용 칼이다. 다른 말로 '비수'라고도 하며, 허리띠나 옷섶에 노리개와 함께 차고 다니기 때문에 '패도(佩刀)'라고도 하였다. 또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장식하였으며, 여자용이냐 남자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몸을 보호하고, 심하면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키는 정절의 상징으로 지니고 다녔다.
신라시대부터 차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늘 차고 다니면서 주머니칼처럼 사용하였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쓰거나 위급할 때를 대비한 호신용으로 쓰였다. 남자들은 주머니나 담배쌈지와 함께 허리띠에 찾고, 부녀자들이 지니고 있던 장도는 자기 몸을 지키거나 자결용으로 쓰였다. 길이는 한 뼘 정도로 매우 작았다.
장도의 종류는 형태나 재료에 따라 나뉜다. 칼집과 칼자루에 복잡한 장식이 붙은 '갖은 장식'과 단순한 장식인 '맞배기'로 구분한다. 또한 칼자루와 칼집을 꾸미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금을 사용하면 금장도, 은을 사용하면 은장도라 하고, 먹감나무를 사용하면 먹감장도, 대모 즉 거북이의 등껍데기를 사용하면 대모장도라고 한다. 그리고 '첨자도'라는 게 있는데, 칼자루에 젓가락이나 과일꽂이나 귀이개 같은 게 붙어 있는 장도를 말한다. 주로 은으로 만드는데, 음식에 독이 있을 경우 은이 검게 변색됨으로 독을 검사하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장도는 칼집과 칼자루가 한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다. 나무를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칼자루와 칼집이 맞물리는 곳에 쇠붙이로 장식 띠를 돌린다. 장식은 대칭적이며 고리가 달리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장도에 쓰이는 목재는 먹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많이 쓰였고, 장식을 위해 산호․은․백동이 쓰였다. 그리고 고리에 꿰는 끈도 원다회(圓多繪) 같은 아름다운 매듭으로 하였다.
장도 가운데서 '갖은 장식'이 가장 화려하다. 그것은 칼집 부분의 아래로부터 태극을 새긴 원장식을 하며, 자석을 구리 못으로 죄기 위해 국화를 놓고 그 위에 납땜으로 왕박이를 한다. 칼날은 시우쇠(강철)를 스무 번 정도 불에 달구어 두들겨서 만든다. 그렇게 해서 칼의 단련이 끝나면 줄로 밀어서 거친 부분을 다듬고 칼날을 세운다. 칼의 한 면에다 '一片丹心(일편단심)' 같은 글귀를 새기고, 불에 달군 뒤 기름에 담가서 열처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꽃자주 또는 남빛으로 물들인 명주끈으로 고리에 매듭을 달면 하나의 장도가 완성된다. 장도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도장(粧刀匠)은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김 종 욱 | 문화사랑방 허허재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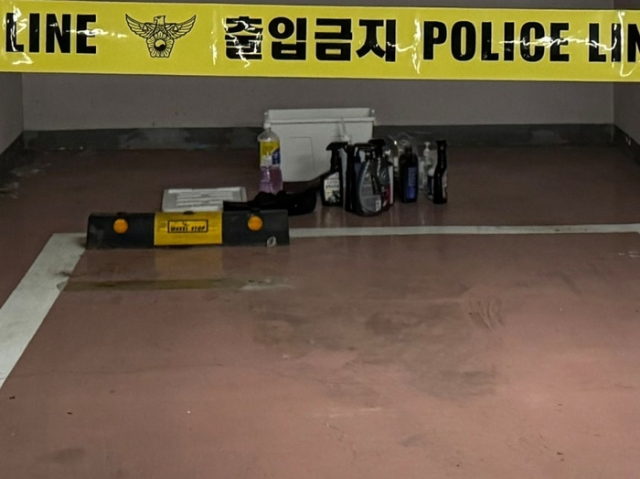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