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白頭大幹) 서쪽지역에서 수혈식(竪穴式) 돌널무덤(石槨墓)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호남 동부지역이다.<
호남지방을 동부 산악지대와 서부 평야지대로 갈라놓는 금남정맥(錦南正脈)과 호남정맥(湖南正脈)을 중심으로 동쪽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진안고원(鎭安高原)으로 알려진 무주.진안.장수와 지리산에 접한 남원.곡성.구례, 구릉성 산지가 발달한 임실.순창이 여기에 속한다.
호남 동부지역은 수계를 기준으로 크게 금강(錦江), 섬진강(蟾津江), 남강(南江)수계권으로 나눌 수 있고, 금강 수계권은 고고학 자료와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동부와 서남부 지역권으로 세분된다.
호남 동부지역에 밀집된 분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금강과 남강수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 그 변천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값진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수혈식 돌널무덤은 백제가 호남 동부지역을 정치적으로 병합하기 이전까지 이곳에 지역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세력의 주(主) 묘제로 밝혀졌다.
더욱이 금강 동부지역권과 남강수계권에서는 돌널무덤이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마침내 중.대형 고총(古塚)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유구나 유물의 속성이 가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어, 종래 인식과 달리 그 조영집단은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가야사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 담긴 자연환경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권역으로만 설정해 모두 대가야 영역에 속했던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병합되기 전까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이 교류하는데 가교역할을 해 문화적 완충권(緩衝圈) 내지 점이지대(漸移地帶)였다.
가야와 백제문화의 접점을 이뤘다는 것. 더욱이 이 곳은 하나의 지역권이나 문화권으로 설정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지형상으로는 매우 복잡한 산악 내지 고원지대를 이룬다.
그런데 종래 단편적 고고학 자료와 지명 연구만을 근거로 호남 동부지역에서 6세기 전반까지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己汶)'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된 섬진강 수계권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입증해주는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된 금강 동부지역권과 남강수계권은 금남.호남정맥 혹은 백두대간의 산줄기로 가로막혀 지형상으로는 섬진강수계권과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토기류의 조합상과 고총의 발전상에서 밝혀진 바로는, 금강 동부지역권과 남강수계권에 지역적 기반을 둔 가야세력은 대가야와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연맹체를 형성한 각기 다른 가야계통의 국가단계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금강 동부지역권에는 대규모 축성(築城)과 봉수시설(烽燧施設)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야계통의 소국, 반면에 남강수계권에는 백제가 서부경남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6세기 초엽 이른 시기에 반파국(伴跛國)과 갈등관계를 보였던 가야계통 소국인 기문이 있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곽장근 군산대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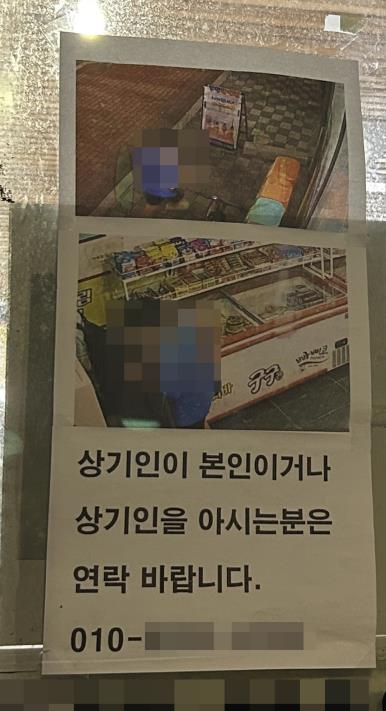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