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은 IMF 이후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 이미 전체 일자리의 30%를 넘어선 상태. 이들의 저임금은 또다른 사회갈등을 불러오고,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도 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들을 살펴본다.
▲저임금의 족쇄 비정규직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의 아파트 경비원인 권모(64)씨는 하루 아침에 월급이 16만원이나 깎였다.
지난해 6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로 전환됐기 때문. 이에 따라 권씨의 월급은 8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삭감됐고 퇴직금, 월차 등 휴무, 각종 보험혜택 등도 사라졌다.
이 때문에 35명의 경비원 중 권씨 등 4명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버렸다.
권씨는 "한 아파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월급이 깎이고 이마저도 용역회사의 문제 때문에 몇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다"고 했다.
권씨처럼 상당수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해부터 '신분의 위험'을 겪고 있다.
관리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비원을 '용역직'으로 잇따라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92만명 중 88만명(95.9%)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청 분석도 있다.
사무보조와 경비 업종의 인력 파견업을 하는 김모(40)씨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 오히려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마구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나 상황이 있다고 해도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로지 경영 논리만 내세워 노동력 착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정옥 총무국장은 "상시 근무자 등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등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철수 정책기획국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는 안정된 직장으로 통하던 금융권이 대표적인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경우.
은행들은 몇년 전부터 창구 직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뽑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받는 연봉은 1천500만원 미만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비정규직 은행원들은 "야간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정규직에 비해 업무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파트 타임 근무가 아니고 상시 근무인원인데도 단지 비정규직이란 이름만으로 차별의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은 "근로자 해고가 어려운 등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비정규직 선호의 원인중 하나"라며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근로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2.8%(465만명) 정도지만 통계청은 55.4%(784만명),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가 이미 800만명을 넘어서 60%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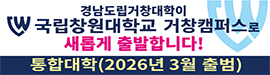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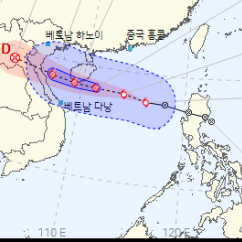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