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고사성어를 보면 중국의 간체자나 일본의 약자로 약간 변했을 뿐 거의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도 적잖다.
이를 자세히 알아본 뒤 자녀에게 지도한다면 한자 공부와 역사 공부를 동시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査頓(사돈) (査 : 조사할 사 등걸나무 사, 頓 : 조아릴 돈)
고려 때 여진을 물리친 윤관(尹灌)과 오연총(吳延寵)은 평생의 친구로 자녀를 서로 결혼까지 시켰고, 작은 시내를 사이에 두고 살았다.
어느 봄날 술이 잘 빚어져 윤관이 오연총과 한 잔 하기 위해 술동이를 하인에게 지게 하고 개울을 건너가려는데 저쪽에서 오연총도 마찬가지로 술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간밤의 소낙비로 개울을 건너갈 수 없어 서로 등걸나무(査)에 걸터앉아 머리를 숙이며(頓首) 이쪽에서 '한 잔 하시오' 하면 저쪽에서 한 잔 하고, 저쪽에서 '한 잔 하시오' 하면 이쪽에서 한 잔 하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이후 서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우리도 사돈(査頓)해 볼까'라고 했다.
▲理判事判(이판사판) (理 : 다스릴 리, 判 : 판가름할 판, 事 : 일 사)
조선 후기에 승려는 억불정책으로 천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심에 있던 사원을 떠나 산중 암자로 들어가 참선과 수도에 전념하는 승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
이들을 理判僧(이판승)이라 한다.
한편 寺院(사원)을 유지하기 위해 공부와 담쌓고 오로지 사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事判僧(사판승)이라 한다.
결국 사판이 있음으로 해서 이판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니 出家하고자 할 때 이판이든 사판이든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여기서 '理判事判'이 나온 것이다.
▲王此吝考女比(자린고비) (王此:흉 자, 吝:아낄 린, 考:상고할 고, 女比:죽은 어미 비)
충주 지방에 한 양반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한 번 사용하고는 태워버리는 종이를 아까워 했다.
그런데 지방을 쓰는 한지에 기름을 먹이면 몇 번을 사용해도 찢어지지 않았다.
기름에 절인 종이 '王此吝(자린)'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리키는 말로써 제사 때 쓰는 지방을 '考女比(고비)'라 한다.
부모 제사에 사용하는 지방을 쓰는 종이 한 장도 아까워 할 만큼 인색한 사람을 자린고비라고 한다.
▲雜同散異[잡동산이→ 잡동사니] (雜 : 섞일 잡, 同 : 한가지 동, 散 : 흩을 산, 異 : 다를 이)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이 편찬한 유서(類書).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제도, 유교경전의 자구, 명가(名家)의 저술, 명물(名物).도수(度數).여항(閭巷).패설(稗說) 등에 관한 책이다.
어느 날 안정복이 대청에 앉아 있는데 하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저 주위의 흔한 이야기들 이지만 어찌나 재미있든지, 안정복은 지루한 역사나 학문 이야기가 아닌 재미있는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온 책이 雜同散異(잡동산이)인데, 이 책의 내용은 양반들이 봐서는 별로 중요할 게 없는 그저 흥미 위주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쓸모없는 잡다한 여러 가지 물건이란 의미의 '잡동사니'가 쓰이게 되었다.
자료제공:장원교육 한자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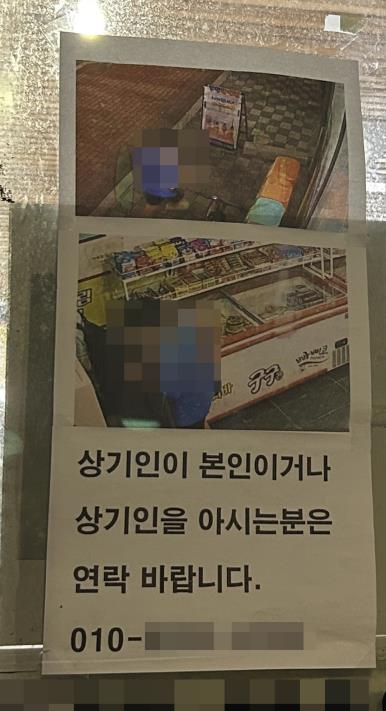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