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창고'로 일컬어지는 잡지의 기원은 17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책방에서 애서가들에게 제공했던 서적 카탈로그로 거슬러 올라간다.
1665년 파리에서 창간된 '르 주르날 사방'이 효시이며, 같은 해 이를 모방해 런던에서 첫선을 보인 영국 학사원의 '철학회보'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2년 영국인 선교사 올링거 부부가 창간한 '코리안 리포지터리'가 처음 나왔다.
그러나 한국인이 손수 발행한 경우는 그보다 4년 뒤였다.
1896년 독립협회가 창간한 '대죠션독립협회회보'와 일본 도쿄에서 나온 '대죠션일본유학생친목회'가 발간한 '친목회회보'가 시초이다.
▲우리나라의 잡지들은 초기에는 주로 민족의 기개와 저항, 독립의식 고취.계몽 등 민족정신사 측면에서 출발한 게 특징이다.
신채호가 발행인이었던 '소년한반도'가 첫 아동잡지이며, 주시경이 편집인인 '가뎡잡지'는 순한글체였다.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은 근대적인 체제를 갖춰 발전의 전환점을 가져 왔다.
그 이후 사회가 전문지식을 요구할수록 잡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다양해졌다.
▲87세의 원로 출판.잡지인 최덕교(崔德敎)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대죠션독립협회회보'부터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때의 잡지들까지 그 역사를 총정리한 '한국잡지백년'(현암사)을 펴내 화제다.
70세를 넘긴 해부터 혼자 고독하게 정리 작업에 착수한지 1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이 책은 전 3권의 방대한 분량(200자 원고지 5천500여장)이며, 384종의 역사와 주요 내용 등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조선조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었던 시절부터 대한제국과 일제시대, 해방 공간,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을 조명했으며, 잡지사뿐 아니라 정치.문화사까지 들여다보게 한다.
특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군소 잡지들까지 망라했고, 새로운 문제 제기까지 하고 있다.
최씨는 방정환이 1920년 8월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는 통설을 뒤집으면서 1914년 최남선이 창간한 '청춘'의 창간사를 대신하는 시 '어린이의 꿈'을 들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경우다.
▲1952년 한국 전쟁 와중에 대구에서 '학원'사에 입사해 출판계와 인연을 맺은 뒤 잡지사의 산 증인으로 통해온 최씨의 이번 작업은 각별히 값져 보인다.
잡지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잡지는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보.지식 집약 산업으로 몸집을 불려 왔다.
문화적인 영향력도 막강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상당 부분 인터넷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태수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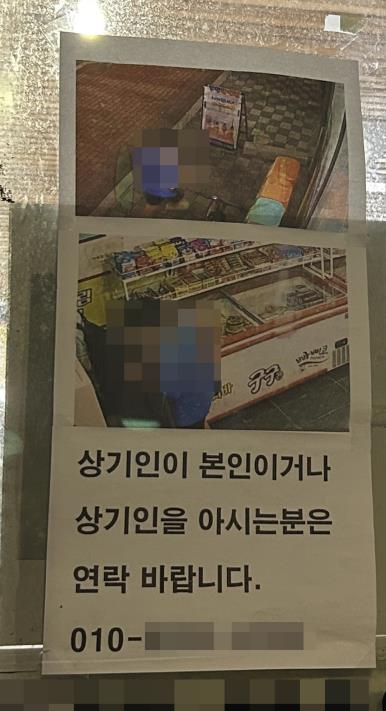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