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야흐로 벗는 시대다.
사진으로, 휴대전화로 연예인들의 벗은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혜영, 성현아, 진재영, 권민중, 그리고 다음엔 누굴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벗은 몸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성적 대리만족을 얻기도 한다.
그뿐이랴. 인터넷에는 몰래 카메라에 포착된 여성들의 알몸이 넘쳐나고 심지어 자신의 벗은 모습을 스스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알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것은 바로 '돈되는'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알몸을 사고 파는 '윤락사업'을 탄생시켰다.
인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공개적으로 벗을까. 중세 '노예 경매시장'에서는 남녀 노예를 모두 벗겨놓고 남자는 이와 근육을, 여자는 임신 가능성과 몸매를 거래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미술작품에서 인간의 알몸은 어떻게 그려지고 표현됐을까.
◇ 나체그림 80여점 분석
'법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림 속에 나타난 인간의 나체를 탐구하고 있다.
나체그림 80여점을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통해 재미있게 풀었다.
저자는 '몸은 생명의 또다른 옷'이라는 관념을 전제로, 강한 생명력을 표현한 알몸그림, 엉덩이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강조한 그림, 젖가슴을 찬미한 그림, 성을 둘러싸고 몸과 마음의 갈등에서 빚어진 사회적 문제를 다룬 그림 등을 분석했다.
20세기 미국 현대화를 유럽화단에 소개한 작가 조지아 오키프는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구도로 그린 꽃그림이 유명하다.
저자는 그녀가 그린 '흑백합' '백장미의 유혹' 등이 파열된 여성의 처녀막이나 처녀막이 다 떨어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 사진과 거의 같다며 화제(畵題)를 '세계의 기원'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림뷔르흐 형제의 '12궁도 인간'은 12개 별자리인 황도 십이궁(黃道十二宮)을 인체에 배치한 작품이다.
저자는 이 작품을 인간의 기본 성격을 구분하는 사성론과 열성, 냉성 등의 성질을 종합하고 여기에다 남성, 여성, 사방위를 가미한 것으로 풀이했다.
니클라우스 마누엘의 작품 '죽음과 소녀'는 누더기 옷처럼 너덜너덜한 살가죽을 뒤집어쓴 시체가 소녀의 스커트 속을 더듬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저자는 여기서 파생된 '알몸 문신'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 젊은 여성들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곧 죽음과 키스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몸을 캔버스 삼아 그린 '문신예술'을 살펴봄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았다.
서양 미술사에서 인간의 누드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표현하거나, 때로는 쾌락적이고 도발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였다.
노골적인 성애의 표현은 어느 시대에나 금기시돼 오랫동안 신화의 주제를 빌려서야만 비로소 표현이 가능했다.
◇ 성의 사회적 문제도 다뤄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나 귀스타브 쿠르베의 작품에서는 힘든 노동을 마친 촌부(村婦)를 통해 건강한 삶을 표현했지만, 툴루즈 로트레크는 몸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춘 여성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는 '우르비노의 비너스' 등 신화의 내용을 표현한 나체 그림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 알몸 표현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기원전 4세기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가장 아름다운 엉덩이의 비너스'는 아름다움의 중심을 얼굴이나 젖가슴이 아니라 엉덩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주의의 대표적 화가 쿠르베의 작품 '파도와 연인'은 성적 흥분이 절정에 빠진 여성의 젖가슴을, 프랑수아즈 부셰의 작품 '헤라클레스와 옴팔레'는 사랑의 전희로서 나누는 깊은 입맞춤을 가장 격렬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미술을 꽃피운 두 게이(남자 동성애자)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 레즈비언(여자 동성애자)인 여신 디아나와 님프를 표현한 부셰의 작품 '목욕 후의 디아나',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동성애를 표현한 페터 파울 루벤스의 작품 '가니메드의 납체' 등을 낱낱이 분석하고 있다.
몸을 지탱하고 내부의 여러 장기를 보호하느라 평생 봉사와 희생으로 일관하지만, 사람들 앞에 떳떳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채 옷에 가려 음지에 주저앉은 인간의 엉덩이. 저자는 이런 엉덩이의 난처하고 비관적인 입장을 재인식하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히프토피아'로 명명한 미술작품 속 엉덩이를 조명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법의학자인 저자는 '바흐의 두개골을 열다' '모차르트의 귀' '명화와 의학의 만남' '반 고흐, 죽음의 비밀' 등 저서를 통해 과학과 예술의 접점을 찾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사진: 그림 속에 나타난 나체가 법의학자의 눈을 통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옷 벗은 마하'와 '옷 입은 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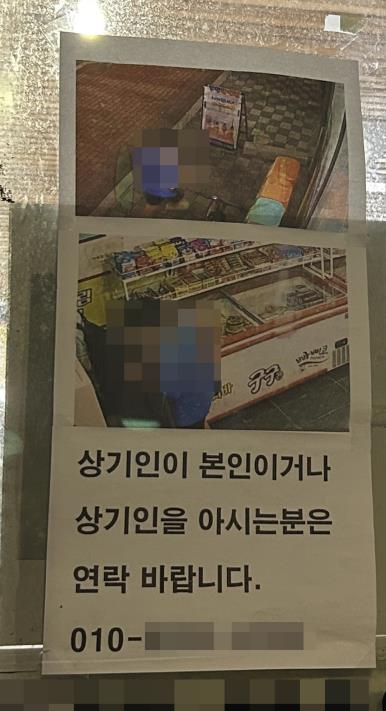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