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 차례 입체영화 붐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괴수가 불을 뿜거나, 귀신이 튀어나오는 조악한 영화였는데, 러닝타임 내내 입체가 아니라 몇 장면이 그랬다. 그래도 당당하게 '입체영화'라고 광고하며 관객을 현혹시켰다. 1986년 '허구의 평면 영상에 도전한 3D 영상'이란 광고 카피로 마흥식과 천은경 주연의 '공포의 축제'가 나오면서 '완전 입체영화'를 표방했지만, 그 역시 호기심만 자극했을 뿐 기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얼마 전 3D로 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얘기했더니 누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거야?"라고 물었다. 아무리 3D라고 해도 꼭대기에서 본다고 없던 장면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평면에 투사된 영상이 3D 안경을 통해 입체처럼 느껴질 뿐이다.
바야흐로 3D의 시대가 도래했다. 3D를 넘어 4D까지 거론되니 영상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다. 4D는 입체영상 외에 의자에 진동장치나 바람이 나오는 에어프레스 등을 설치해 오감으로 영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4D '터미네이터'를 관람했는데, 의자가 들썩이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물까지 뿌려 대는 통에 혼이 빠진 기억이 있다. 4D는 아직까지 영화 감상보다는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다.
3D는 불법 다운로드 등 영화계의 현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극장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빠져나가는 관객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아바타'만 하더라도 디지털이나 아이맥스가 아니면 도저히 영화의 제 맛을 느낄 수 없도록 제작됐다.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상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광경은 가히 신기원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영화는 시각만 자극하는 매체는 아니다. 이번 주 개봉된 '파나노말 액티비티'는 조악한 캠코더 하나로 찍은 영화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켜 둔 캠코더의 영상이 사람을 몸서리치게 만든다. 나도 모르는 뭔가에 대한 공포. 그것은 오히려 조잡한 영상일수록 더욱 현실감 넘치게 다가온다.
한때 PC의 마우스는 옵션이었다. 마우스는 비싼 입력장치였고, 모든 게임도 키보드 하나로 조작했다. 요즘은 마우스는 물론이고 조이스틱 등 게임을 즐기는 부가 장비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체감의 정도도 그만큼 증가됐을까.
'스타워즈'(1977년)에서 구조 메시지를 보내던 레아 공주를 봤을 때는 언젠가 완벽한 입체 영화가 나와 레아 공주의 치마를 들치며 '아이스케키!'라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 기술 속도로 보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그런 날이 반가운 것은 아니다. 영화는 눈이 아니라 뇌를 움직이는 영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김중기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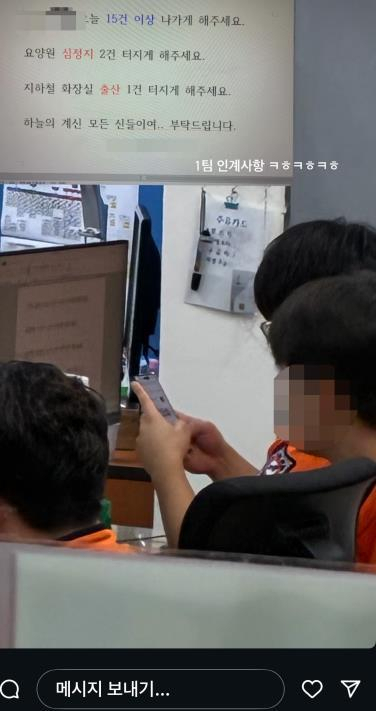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