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결 같은 산책이었다. 1천500여년을 거슬러 대가야를 만나러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았다. 고령읍 동쪽에 자리 잡은 주산(主山)은 읍내를 내려다보며 양팔로 감싸안은 형세다. 산줄기 오솔길을 따라 한 걸음씩 옮겨 디딜 때마다 세월의 더께에 쌓여있던 대가야는 조심스레 감춰진 속살을 내보였다. 파란만장한 500여년 대가야 역사를 어찌 짧은 글로 대신할 수 있을까. 그저 더듬어 짐작할 수밖에.
고령군청에서 남쪽으로 길을 잡아 고령장터와 우시장을 거쳐 1.5km쯤 가면 오른편에 '고아동벽화고분'으로 오르는 산길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대가야 고분관광로'가 시작된다. 표지판에서 알려주는 원래 출발점은 고령학생체육관쪽이다. 하지만 그쪽은 오르막이 가파르고 길어서 쉽게 지치고 지루해진다. 길을 돌아들면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는 고분길 묘미를 제대로 즐기려면 고아동에서 시작하는 편이 오히려 좋다. 거리는 4km 남짓으로 내쳐 걸으면 한 시간 정도에 산보를 마친다. 하지만 이 길에서 서두름은 어리석음과 동의어다. 그 옛날 이 길을 거닐던 대가야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더디게 걸을수록 잊혀진 역사는 또렷이 드러난다.
다시 고아동 길을 시작하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십여개 돌계단을 오르면 사적 제165호 고아동벽화고분이 모습을 드러낸다.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기 수십년 전인 6세기 초 축조된 대가야 왕릉으로 추정되며, 가야 유일의 벽화고분이다. 옛 무덤 옆에는 겨우내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지냈을 백일홍 한 그루가 쓸쓸히 서 있다. 잎이 돋고 꽃이 피면, 무덤 위 잔디도 파릇파릇 살아날 터. 하지만 겨울 찬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그 곳에는 왠지 모를 처연함이 서려있다. 500년 왕업을 이어갔건만 남은 것은 주인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무덤들뿐. 조금씩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지만 남겨진 사료의 부족함과 후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진 세월이 너무 길었다.
고령에 남아있는 수백여기의 고분 중에 도굴꾼의 손을 타지 않은 무덤을 찾기 힘들 정도다. 고아동벽화고분도 마찬가지. 1963년 발굴 작업에서 아름다운 연꽃 그림이 발견됐지만 지금은 녹슨 철문이 흉측스럽게 무덤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사적'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다. 무덤 안의 모습은 철제 안내판에 붙어있는 사진과 그림 몇 장으로 미뤄 짐작할 밖에. 길 옆 참나무와 소나무 사이마다 봉긋하게 솟은 흙더미가 수십여개다. 일부러 꾸며놓기라도 한 듯 흙더미 윗부분은 푹 꺼져있다. 도굴의 흔적이다. 역사를 지워버린 질 나쁜 도적들. 그들이 남긴 생채기는 고분길 내내 이어진다. 한때 숲을 가꾼다며 봉분 옆이고 위고 할 것 없이 빼곡히 나무를 심어버렸으니 지금 남은 흉터를 보며 도굴꾼만 탓할 일은 아니다. 길 안내를 맡은 이용호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린 시절 산에 오르면 흙무더기를 파헤친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며 "당시만 해도 온전한 모습을 갖춘 도자기도 수시로 파낼 수 있었다"고 했다. 문학도를 꿈꾸던 이용호씨는 추억에 상상력을 더해 '대가야의 전설'이라는 단편 소설을 쓴 적도 있다고 했다. "무덤뿐 아니라 산줄기 곳곳에서 깨지지 않은 도자기가 나오곤 했지요. 왜 그럴까 궁금한 나머지 혼자 상상을 해 봤습니다." 미발표 작품이지만 줄거리가 흥미롭다. 왕궁에 도자기를 납품하던 한 도공 가족은 어느 날 궁성에 갔다가 변란이 벌어진 소식을 듣는다. 난을 피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아까운 도자기를 버릴 수도 없었던 것. 궁리 끝에 산 속 깊은 곳에 도자기를 고이 묻어두었다가 변란이 끝나면 다시 파내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끝내 도공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천년의 세월도 훨씬 지나 이제야 다시 빛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용호씨는 학창 시절 산에서 도자기 파편을 주워오는 숙제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 시절 한 트럭분이 넘게 모였던 도자기와 그 파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지 알 길이 없다.
산길을 내려서면 대가야역사테마공원이 나온다. 펜션 짓기가 마무리 단계다. 왼편 산자락에 봉분 모양을 본 딴 둥근 지붕의 건물 두 채가 눈에 들어온다. '임종체험실'이다. 고분길을 걷노라면 새삼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 결국 죽음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던가. 이 땅을 호령하던 왕들도 우주의 법칙을 거역하지 못해 땅 속에 묻혔고,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대가야 사람들은 이승의 삶이 내세에 이어진다고 믿었다. 산 사람을 함께 묻었던 순장(殉葬) 관습도 이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가야는 생매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해설사는 "두개골이 함몰된 흔적이 남아있고, 아이를 감싸안은 어른의 유골이 누운 자세 그대로 발굴된 점으로 미뤄 매장 직전에 숨을 거두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했다. 하지만 멀쩡히 살아 숨 쉬는 사람의 머리를 도끼 따위로 내리쳐 목숨을 빼앗고, 이를 악다물고 울부짖지도 못한 채 흐느꼈던 나머지 식솔들의 한은 어쩌란 말인가.
숱한 죽임을 지켜봤을 이 길은 아무 말이 없다. 물이 마른 계곡 사이를 걸터앉은 소박한 나무 구름다리를 건너며 '대가야고분관광로'는 이어진다. 한낮에도 그늘만 이어지는 빼곡한 솔숲 사이로 나무만큼 많아보이는 작은 봉분들이 솟아있다. 고분길을 반 정도 지났을까. 시야가 탁 트이며 저 멀리 앞쪽에 지산리 고분군이 펼쳐진다. 나무에 가린 채, 세월에 잊혀진 채 숨어버린 봉분도 적잖이 많을 터. 크고 작은 봉분을 합치면 200여기에 이른다. 지산리 고분군이 자리 잡은 주산은 대가야의 진산이었다. 읍내 아래 왕궁이 있었고, 바로 뒤편 주산에는 사적 제61호로 지정된 주산성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왕궁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제법 가파른 길을 올라서니 거대한 순장무덤이 야트막한 산처럼 다가선다. 정상에 위치한 지산리 44호 고분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순장무덤. 내부를 원래 모습 그대로 대가야왕릉전시관에 재현해 놓았다. 이 길을 올라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지니. 조바심 내지 말고 정상부에 천천히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고령읍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동행한 김영대 작가는 한동안 말을 잊었다가 불쑥 한마디 건넸다. "안 왔더라면 후회할 뻔 했네. 마치 역사 속으로 성큼 들어선 것 같아." 주산성 흔적을 옆에 끼고 내리막길로 돌아들면 고분길도 막바지에 접어든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고분길을 내쳐 걸을 것이 아니라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와 왕릉전시관도 꼭 둘러볼 일이다. 마침 4월 8일부터 11일까지 '2010 대가야 체험축제-용사의 부활'이 펼쳐진다. 대가야 철갑용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글·사진=김수용기자 ksy@msnet.co.kr
도움말=이용호 문화관광해설사 054)950-6060
전시장소 협찬=대백프라자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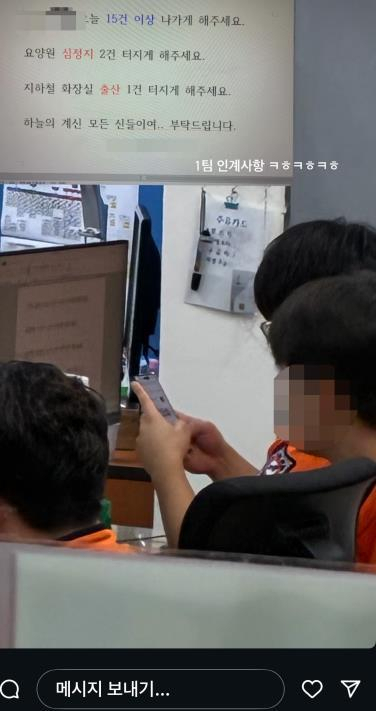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