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 춘양에서 흘러내린 운곡천이 낙동강에 합류하고 안동댐 건설 뒤 은어들이 정착한 고향, 봉화군 명호면. 물살의 빠름과 느림, 물길의 굴곡이 좋아 래프팅의 적지로도 꼽힌다.
그 중에서도 지형과 산수가 빼어나 귀농인들의 정착지로 각광받는 곳이 명호면 풍호1리 비나리마을이다. 마을 동쪽 35번 국도를 따라 낙동강이 흘러내리고, 기암절벽은 남으로 안동 도산면과 이어진다. 청량산과 낙동강이 부딪쳐 만들어낸 절벽은 특이하고 오묘한 형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낙동강 물길에서 서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비나리는 풍락산이 빙 둘러싼 타원형 분지에 입구 쪽에 홀로 삐죽 솟은 독산이 어우러져 여지없는 돛단배 모양이다. 이 때문에 독산(獨山)은 돛산으로도 불린다. 분지에는 윗모치, 중간모치, 아랫모치로 나눠 약 60가구가 모여 있다. 주민들은 북쪽 풍락산 자락을 개간해 밭을 일구며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 마을에는 옛날 영월 신씨가 가장 먼저 들어온 뒤 김영 김씨, 기계 유씨, 안동 권씨 등이 차례로 입향했다고 한다.
마을에는 낙동강 절벽과 풍락산성을 무대로 용마를 타고 호령했던 임장군의 전설이 스며있고, 주민들은 임장군을 모시는 당산나무 앞에서 해마다 마을 제사를 올리고 있다. 산세와 풍광에 반한 도시인들의 귀농이 늘고, 마을 앞 강에는 은어 치어들이 몰려 마을의 풍요를 더하고 있다. 초롱불로 마을을 밝혔던 초롱계가 100여 년을 잇고, 마을 동제를 주관할 제관을 뽑는 '대잡이' 전통을 이어가며 공동체의 끈을 더 튼튼히 묶어주고 있다. 마을 전통을 잇는 주민들과 새로 정착한 귀농인들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활기를 띠는 보기 드문 산골마을이다.
◆백마 타고, 절벽 턱걸이로 수련한 임장군
비나리 앞 낙동강 깊은 물에서 용마가 났다. 매우 잘 달리는 훌륭한 백마였다. 백룡담은 백마의 태생지다. 백마가 난 뒤 3일 동안 울자 태어난 인물이 임장군이다. 임장군은 어릴 때부터 신체와 언행이 남달랐고, 10세 때 병서를 읽었다. 힘이 장사였다. 비나리마을을 둘러싼 풍락산성에서 노닐며 전쟁놀이를 즐겼다. 백룡담에서 태어난 백마는 잘 달렸지만, 마을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마였다. 하지만, 임장군이 달래자 순순히 따랐다. 임장군은 백마를 타고 다녔고, 비나리 강 건너편 절벽에서 턱걸이를 하며 무술을 연마했다.
봉화군지 '기인(奇人) 편'에는 "임장군은 조선 16대 인조 때 사람으로 이름은 전하지 않는데 '석돌(石乭)'이라는 설도 있다. 용마 한 필로 훈련을 쌓았고, 17세 때 출가해 병자호란에 임경업 장군을 찾아가 돕다 이후 청나라에 들어간 뒤 종적을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나리마을에는 임장군의 흔적이 곳곳에 전해오고 있다. 비나리에서 동남쪽 500m 지점의 낙동강에는 임장군이 탔던 용마가 태어난 '백룡담'이 있고, 백룡담 옆에는 임장군이 무술을 연마해 100m를 날아 절벽에 턱걸이를 했다는 '턱걸바위'가 있다.
비나리에서 풍락산을 통해 명호면 소재지로 넘어가는 고개, 옷갓재. 임장군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옷과 갓을 벗어놓고 쉬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옷갓재에는 '돈영부사 울성부원군 임철 묘'로 비문이 새겨진 무덤이 있는데,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 묘가 임장군의 할아버지 무덤이라고 믿고 있다.
신영록(84) 씨는 "임장군이 말을 타고, 턱걸이를 하며 무술을 연마하다 여기가 경치가 좋으니 정착을 했다고…."라고 말했다.
권영식(80) 씨도 "백룡담이라고 웅덩이가 깊은 거기서 용마가 나고, 임장군은 용마를 얻고 그 위에 턱걸바위에서 턱걸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임장군을 부르는 대잡이와 동제
임장군은 마을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다. 마을사람들은 매년 1월 14일 동제를 지내는 느티나무를 '임장군 서낭님을 모시는 나무'로 부르고 있다. 비나리 입구의 수령 60여 년 된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이자, 임장군을 모시는 나무이기도 하다.
마을 제사는 매년 음력 1월 3일 제사를 주관하는 10명을 뽑는 데서 출발한다. 3일 동안 마을을 위해 기도하는 당주, 축문을 읽는 축관,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 3명, 음식 등 제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유사(집사) 5명 등이다. 주민들은 동제와 관련된 준비를 위해 이날 갖는 마을회의를 '천탁공의'라고 한다. 이 천탁공의에서는 '대잡이'라는 마을의 독특한 의례를 통해 제관을 선출한다. 소나무를 베어 만든 대를 잡은 대잡이는 통상 당주를 겸하고, 지난해 제관·축관·집사 등을 했던 사람들이 차례로 대를 잡은 뒤 대가 흔들리면 제관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 대잡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계속 주문을 왼다. 바로 임장군 서낭님의 강령을 기원하는 의례다.
"임장군 서낭님 오늘 매년 해오던 행사를 정월 열나흘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 고사를 올리기 위해 임장군 서낭님을 초청하오니 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하강하여 주시옵소서. 서낭님 마음대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권병조(82) 씨는 "당주는 (선출된) 그날부터 저녁에 다니며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음행도 못하는 기라. 열나흗날 고사 올리는 날까지. 당주는 초사흗날 동네 돈을 가지고 장보러 가는 기라. 과일 사고, 포 사고 만반의 준비를 해 그 음식들 갖다 놓고 3일 동안 기도하고…"라고 말했다.
동제에 쓸 돼지고기와 시루떡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유사들이 직접 준비한다. 장에서 사온 돼지를 나무 밑에서 잡은 뒤 직접 삶고, 방앗간에서 빻아온 쌀을 시루에다 얹고 솥을 걸어 떡을 찐다는 것. 제사비용은 과거에는 마을 공동 소유의 동전(洞田)에서 나온 수익을 통해 충당했으나, 지금은 동전을 붙이는 사람이 없어 이 밭을 판 돈에서 나온 이자와 각 가구마다 내놓은 찬조금을 보태 제사상을 준비한다.
비나리 사람들은 임장군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 다음날 제수로 쓰였던 떡과 고기를 집집마다 나눠 먹으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고, 마을회관에서 대소사를 논의하고 사물놀이를 하며 친목을 다진다. 임장군과 동제는 마을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인 셈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공동기획:매일신문·(사)인문사회연구소
◇마을조사팀
▷작가 권상구·이가영 ▷사진 박민우 ▷지도일러스트 이지은
※마을이름 유래는- 솟은 바위에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양 빗대
비나리가 있는 봉화군 명호면 풍호1리는 풍락산(豊樂山)과 낙동강에서 각각 '豊'과 '湖'를 따왔다.
비나리는 예부터 비진(飛津) 또는 배형곡으로 불렸다. 마을 형태가 배처럼 생겼다고 배형곡이라고 했는데, 그 배가 물이 차면 떠나듯 마을 사람들도 잘살게 되면 떠나버린다고 비진으로 불렀다고 한다. 주민들은 비진이란 어감이 좋지 않아 1910년쯤 비나리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비나리는 마을 앞 낙동강 가운데 푸른 바위가 우뚝 솟아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을 빗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마을은 윗모치, 중간모치, 아랫모치로 나눠진다. 윗모치에는 양지마와 음지마, 중간모치에는 마재, 아랫모치에는 대문안구석, 개구석 등이 각각 있다.
김병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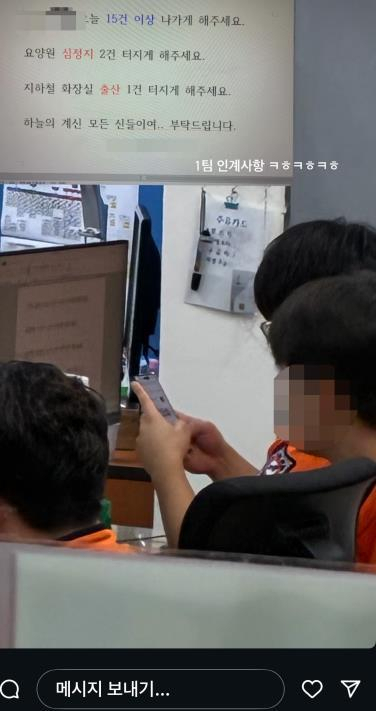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