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회색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있다. 그것도 현대미술 주류의 한복판인 영국에서 말이다.
앨런 찰튼(Alan Charlton)에게 예술이란 '나무틀 짜기, 천 씌우기, 물감칠하기, 벽에 걸기'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단 하나도 '덜' 중요한 과정이 없다.
갤러리 신라에서 한국에서 세 번째 전시를 여는 앨런 찰튼을 만났다. 그는 이번 전시에도 작품 디스플레이를 꼼꼼하게 마무리했다.
"나무 틀을 짜고, 물감을 칠하고, 벽에 거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40년 전 예술론(論)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는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40년간 줄곧 똑같은 개념으로 회색 그림만 그려오고 있다. 스스로를 '회색 그림을 만드는 작가'라고 정의한다. 매일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란한 이미지의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대미술계에서 그의 존재는 특이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다. "40년 전 결심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변화는 우리 안에 있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림 내부에 변화가 있어요." 그의 회색 단색화는 단호하고 명료하고, 또 섬세하다. 회색을 고집하는 것은 "회색은 표현력이 가장 낮은 중성의 색이며, 색의 의미보다 빛의 밝기를 표현하면서 명도의 무한한 변주가 가능해서"라고 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다. 작품은 아이디어의 결과물이자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특히 작품을 갤러리 공간에 배치하는 작업 역시 그에겐 작품의 일종이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예술인 것이다.
온갖 현란한 미술계에서 오로지 한 길만 고집하는 그는 "나만의 언어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색'이 아닙니다. 내 작품을 구성하는 나무, 캔버스, 회색은 뉴테크놀로지와 반대되는 것들이죠. 주변의 시류는 돌아보지 않아요. 오로지 제 작품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는 '꾸밈없음'을 위해 캔버스 위에 회색을 칠할 때조차 캔버스의 올이 보일 정도로 얇게 칠한다. 물감의 터치와 두께가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절제하기 위해서다.
그는 작품에서 '4.5㎝'를 자신만의 모듈로 삼는다. 모든 작품은 4.5㎝ 단위로 나뉘어지며, 작품의 간격 배치도 4.5㎝다. 절제된 작품은 공간과 어우러지며 빛과 아우라를 드러낸다.
그는 젊은 작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라'는 것과 '자신과 잘 맞는 젊은 화랑을 만나라'는 것. "자기 작품과 비슷한 화랑을 만나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큰 화랑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죠. 작지만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커갈 수 있는 화랑을 만나도록 하세요."
이번 전시는 5월 31일까지 갤러리 신라에서 열린다. 현대미술의 대가가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고집과 집념을 확인할 수 있다. 053)422-1628.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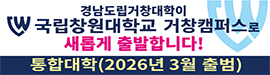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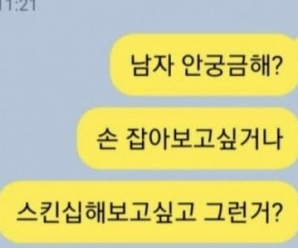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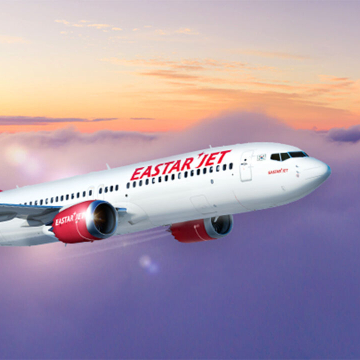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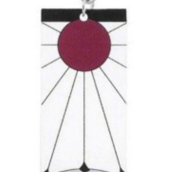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