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벚꽃이 진다. 벚나무 아래에서 꽃비(花雨)를 맞는 날도 오늘내일뿐이라 생각하니 서글퍼진다. 아파트 앞마당에도, 세워둔 자동차 위에도, 보도블록에도 꽃잎이 가득 쌓였다. 오늘은 땅에 뒹구는 꽃잎조차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일이면 발에 밟히고 먼지가 묻어 보기 싫은 존재가 될 것이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이 우리네 삶과 무척 닮았다. 그렇게 화사한 자태를 뽐내더니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허무한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여류작가인 오노노 코마치(小野小町)는 이렇게 와카(和歌)를 썼다. '화려한 벚꽃/ 빛바래 가도다/ 꿈결같이/ 젊음도 바래지네/ 봄장마 지나는 사이에.' 작가는 일본에서 중국의 양귀비와 비교될 만큼 전설적인 미녀였기에 벚꽃을 보면서 자신의 나이듦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일본인들은 벚꽃을 소재로 수많은 와카와 하이쿠(俳句)를 남겼다. '이렇게 한가로운 봄날에/ 왜 벚꽃은 이렇게 서둘러 지려고 하는 걸까' '이 세상에 벚꽃이 없었으면/ 봄 마음은 한가로울 텐데…' '밤에 핀 벚꽃, 오늘 또한 옛날이 되어버렸네'.
낭만이 철철 넘친다. 그렇지만 이 시인들의 감성은 절망감, 허무함, 비장함, 애상과 같은 극단적인 미의식과 연결돼 있다.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본 한국인이라면 약간의 아쉬움이나 서글픔 정도를 느끼겠지만, 일본인처럼 목숨을 걸듯 자신의 근원적인 감정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이 같은 일본인의 미적 개념을 '모노노아와레'(物の哀れ)라고 한다. 사물의 마음, 또는 사물의 비애와 슬픔을 아는 미적 감수성이란 뜻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서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 선비들은 봄이면 눈 같은 매화를 사랑했고 진달래, 배꽃을 소재로 많은 시를 남겼다. 벚꽃을 노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의 벚꽃놀이는 일본 문화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즐겁게 놀면 되는 것이지, 근원이 어디인지 따지는 것은 어리석다.
예전 정치권에서는 변절자 혹은 회색주의자를 두고 벚꽃의 일본말인 '사쿠라' '사쿠라 같은 놈'이라고 욕했다. 여기에서 사쿠라는 '일본인 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반성한다' '잘못했다'고 읍소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뿐, 선거가 끝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이나 계파 패권주의에 골몰할 것이 뻔한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사쿠라'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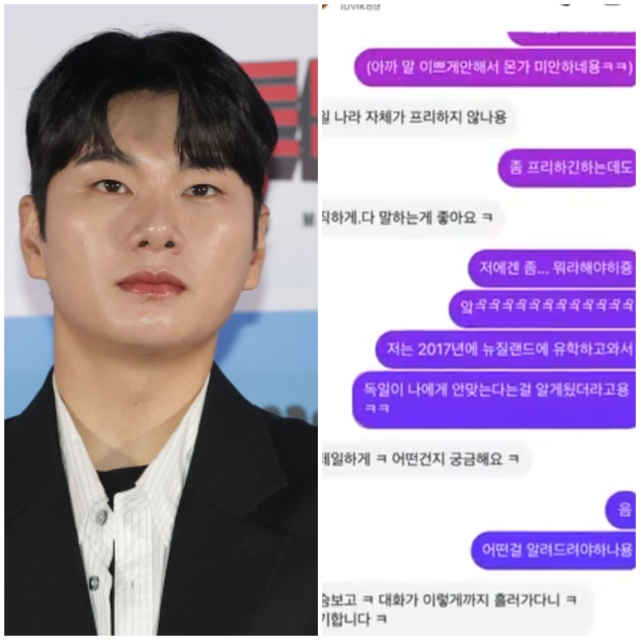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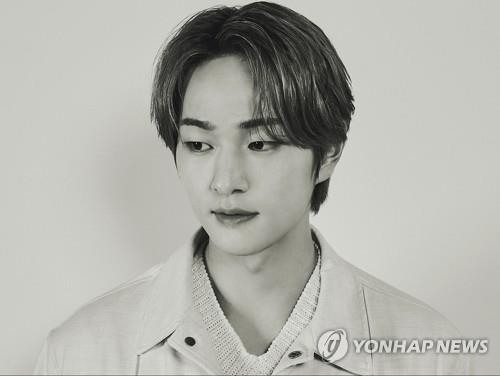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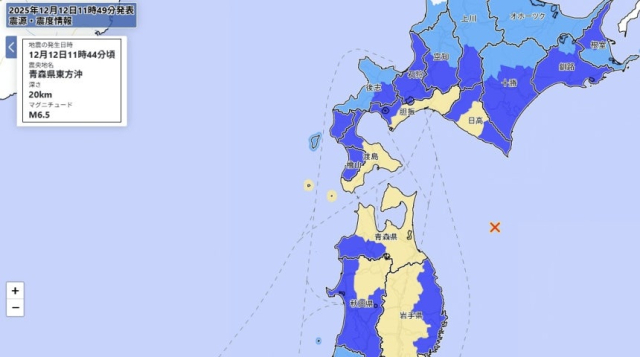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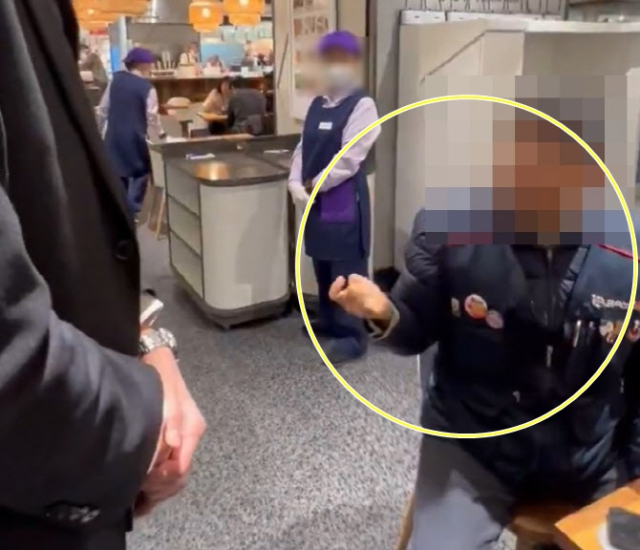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