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장
계승은 풀섶에 숨어서 허리춤에 손을 넣어보았다. 단도가 만져졌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풀섶 사이로 허연 입김이 뿜어졌다. 코끝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밤이었다. 장상만과 오돌매는 어디로 갔을까. 다른 달성회 회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백 미터쯤 앞에, 최욱진의 기와집은 어둠 속에서 학이 날개를 펴듯 우아한 자태로 서 있었다. 최성달의 집 앞에 모여 있던 일인 자경단(自警團)들이 횟불을 들고 계승이 숨은 숲 쪽으로 오고 있었다. 계승은 허리춤에 찬 단도를 풀어 바닥에 던졌다. 저들과 맞설 자신이 없었다. 만약 잡힌다면 순순히 투항해버릴 참이었다.
왜 자신이 덜컥, 이번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던가. 대구에 돌아온 지 사흘째, 장상만과 술을 마시다 큰시장에서 장사하는 젊은 상인들의 모임인 달성회를 알게 되었지만, 이런 사건까지 가담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 일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밀려드는 파도를 몇 명의 손으로 막을 수 없지 않은가. 마욱진은 53세인 칠성리 사람으로, 기차로 들어오는 물자를 각 일인 상점으로 보내는 수화물 취급자였다. 수하에 20여명을 거느리고 수십 마리의 우마를 이용해 대구는 물론이고 경산, 청도, 포항까지 물건들을 보냈다. 그의 역할로 일인의 무역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마욱진에게 치명상을 가해야 해. 달성회 회원들의 결의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새벽 두시쯤에 마욱진의 집 앞에 도착했다. 담장 네 귀퉁이마다 한 명씩 피리와 단도를 지니고 망을 보았다. 계승은 동쪽 귀퉁이를 맡았다. 미리 짜놓은 대로 세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할 때였다. 낌새를 느꼈던지, 일인 요릿집 쪽에서 횃불이 훤하게 밝아진다 싶더니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동쪽과 남쪽 사이에서 들리는 발소리였지만, 계승은 피리를 불지 못했다. 어디선가 휘파람새처럼 짧은 피리소리가 울렸고 젊은 상인들은 그림자처럼 벽 아래로 흘러내렸다. 계승은 가까운 수풀로 몸을 숨겼다.
자경단의 횃불이 계승이 망을 보았던 모퉁이에서 돌아나갔다. 계승은 횃불의 움직임을 주시하느라 가까이서 흔들리는 수풀을 보지 못했다. 눈앞에서 불쑥 뭔가가 몸을 드러냈다. 곱사등이 오돌매였다.
"왜 피리를 불지 않았소?"
오돌매는 단도를 꺼내 손끝으로 쓱쓱 쓸며 말했다.
"모두 어디로 갔어요?"
"튀었지. 빠져나갈 골목은 어디로든 있소."
"아……."
계승은 다행이라는 한숨이 신음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설핏 들었다.
"비밀이 누설된 거야. 자경단 놈들이 마욱진 집까지 지킬 리가 없는데 말이야."
계승은 가슴이 서늘했다. 일본 상인들이 자경단을 결성한 것은 러일전쟁이 끝난 지난해 7월이었다고 한다. 전쟁에 승리한 후로 일반 한인들이 유화적으로 바뀌었는데도 화적들의 공격은 더 잦아졌다는 것이다. 자경단들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으면 마욱진의 집 담장을 타넘었을 거고, 곧 도착한 저들에게 잡혔거나, 적어도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잡힌다면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계승은 대구에 돌아온 지 닷새 만에 잡혀온 화적들이 서문시장 뒤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었다.
읍성 철거를 하청 받은 사람을 죽였던 게 달성회요?
계승은 그것을 곱사등이에게 물으려다 멈칫했다. 자신도 성 철거에 한몫했기 때문이었다. 도리어 곱사등이에게서 그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했다. 아까 버린 단도가 보이지 않았다. 억새 줄기가 빽빽하게 자라 있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었다.
오돌매가 칼등으로 계승의 어깨를 툭 쳤다.
"담에는 제대로 피리를 부시오."
오돌매가 수풀을 손으로 저으며 나가자고 했다. "난....뒤로 돌아갈렵니다." 계승은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오돌매와 같이 가는 게 끔찍했고, 자경단 횃불이 보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했다. 오돌매가 수풀을 뚫고 나아갔다. 수풀 위로 머리도 보이지 않아 그가 나가는 자리에 풀만 흔들렸다.
계승이 밀양가도로 돌아 읍성 남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날이 희붐해지고 있었다. 성 안은 아직 잠을 깨기 전이었다. 광문사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계승은 잠시 눈을 붙이려고 광문사 인쇄실 뒷방으로 들어갔다.
잠이 오지 않았다. 마당에는 새벽에 내린 서리가 녹으면서 낙엽이 눅눅하게 젖고 있었다. 12월말인데도 백양나무에 아직 입이 남아 있었다. 직원들이 출근하려면 한 시간은 지나야 할 것이다.
광문사는 방이 두 칸이고, 왼쪽으로 정자 모양의 마루가 붙어 있는 기와 건물로 조선조 때 취고수청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악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취고수청이 폐지되자 전임 관찰사가 광문사에 차여(借與)해준 게 지난 5월이었다. 광문사는 가운데 방을 회의를 하는 곳으로, 우측 방을 인쇄실로, 본채와 기억자로 붙은 건물을 서고로 사용했다.
계승은 마당으로 나가 낙엽을 갈퀴로 끌어 모았다. 집 둘레를 한 바퀴 돈 뒤, 인쇄실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오기 전에 청소라도 해놓을 참이었다. 어차피 잠을 자긴 틀린 것이다. 수건을 들고 넉 자짜리 장롱 크기인 인쇄기를 꼼꼼히 닦았다. 가압기와 식자판이 놓인 곳에 묻은 잉크를 제거했다. 어디선가 총포 소리가 탕탕 울렸다. 말 울음소리가 마치 광문사에 말이 들어온 듯이 가까이서 들렸다.
아무 일 없을 테지. 달성회 청년들은 무사할까? 설령 잡힌다 해도 가담자들이 누군지 실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안을 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호주머니에 거치적거리는 게 있었다. 손바닥만 한 피리였다. 숨어 있을 때 단도는 버렸지만 피리는 여태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피리를 산산이 부수어버리고 싶었다. 숨길 곳이 마땅히 없었다. 도장방 이불 속에 피리를 집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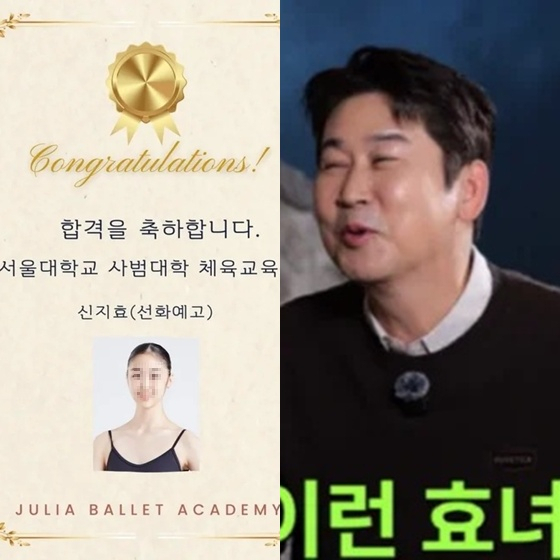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