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산다, 한때는 야망을 품고 이곳에 왔고, 한때는 갈 데가 없어 이곳에 왔으나…가족들을 잊기 위해 산다, 가족들을 잊지 못해 산다….'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차창룡 시인은 '고시원에서'란 시(詩)에서 크고 작은 이산의 아픔과 고독의 등짐을 진 채 이웃과 단절된 삶을 이어가는 고시원 사람들을 이렇게 그렸다.
고시원은 한때 청운의 꿈을 보듬었던 희망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외된 사람들이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맨몸 하나 겨우 눕히는 최후의 공간이 되었다. 방 한 칸 제대로 구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외로움과 서러움을 삭이는 쓸쓸한 주거용 둥지가 되었다.
고시원은 1970, 80년대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겨났다. 1990년대에는 50개 이상의 독방을 갖춘 대형 고시원까지 성업을 하며 대학 문화의 한 기형(畸形)을 형성했다. 저렴한 방값과 효율적인 학습 환경 때문이었다. 그런 고시원이 다양한 인간 군상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전남일 가톨릭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거 공간의 변화를 서술한 '집'이라는 책에서 한 칸짜리 집의 원형은 구한말 도시 빈민층의 움막집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주인집 행랑채와 한국전쟁 때의 변두리 판잣집, 1960년대 달동네와 옥탑방, 산업화시대의 반지하 셋방과 쪽방촌으로 나타났다가, 오늘날 고시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빈곤층의 주거 공간에 안전시설이 확충되었을리가 없다. 서울 도심 고시원을 덮친 불길이 또 고단한 목숨들을 앗아간 연유이다. 정부의 대응도 딜레마이다. 규제를 하자니 방값이 오르고, 묵인하려니 사고가 걱정이다.
고시원은 화려한 도시의 뒤안길에 드리운 짙은 그늘이다. 밑바닥 삶들이 매일매일 쓰디쓴 시험을 치르는 곳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설가 박민규는 단편 '갑을 고시원 체류기'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절망의 공간을 익명으로 떠돌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극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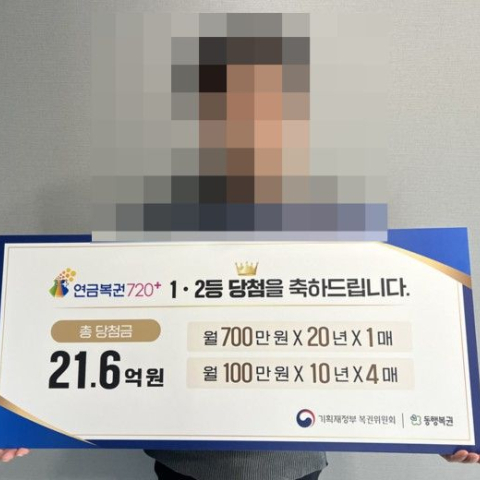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