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예술계 화두 중 하나는 '예술인 복지'이다. 대구에서도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를 꺼내고, 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과정을 최근 한 포럼에서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예술인들은 복지에 대해 개념이 부족하고, 특히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 더욱 관심이 적은 듯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그간 예술가로 등록한 예술인 수가 서울은 약 3만 명, 부산은 4천 명 정도인데, 대구는 1천 5백 명 내외라고 한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 대학의 예술관련 학과도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예술인 수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의 예술가들은 부유해서 복지에는 관심이 낮은 것일까?
아마도 사는 일로 바빠서 변화의 대처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요인으로 여겨진다. 복지재단이 내게 무슨 덕이 되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과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부터 드러내는 대구지역의 정서도 한 몫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지재단에 등록한다고 해서, 해가 되는 일은 없다. 예술인으로 인정되어 등록 되면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고, 소속이 없는 자립형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인 증명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돈이지만 창작준비지원금 같은 제도도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를 밤 늦게까지 맡길 특별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예술가들은 자존심을 먹고 산다. 학교에 재직하거나 예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위권의 소수를 제외하면, 전업예술가들은 늘 배가 고프다. 자기 예술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예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예술가의 특성상 창의력은 남다른 생활방식에서 출발되기도 하여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예술가를 두고서 '과도한 낭만성과 비대한 자의식'의 존재라는 표현이 쓴웃음을 짓게 한다.
그러한 예술가들의 다소 비현실적인 생활태도가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근자에 서울의 유수한 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가 양양한 한 젊은 예술가가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사인은 굶주림이었다는 신문기사로 세간이 술렁거렸던 적이 있었다.
복지재단의 여러 일들을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문 두드릴 곳이 없는 예술가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것으로 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토가 '예술인의 꿈과 열망을 응원합니다'인 것처럼, 예술가들의 권익보호와 어려운 삶을 돌아봐주는 기관이 되리라 기대하며, 대구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예술인들의 열망을 담아가길 기대한다. 채명 무용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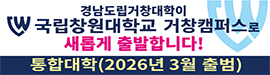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