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직제(職制)로만 존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끝내 없어질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해져 공수처가 발족하는 7월 이전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4월 총선 후 특별감찰관법 폐지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망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인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든 안 하든 특별감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임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지 않아도 특별감찰관 공석(空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점이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 추천을 받아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결국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폐지는 이런 위법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모면할 수 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완벽히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감찰관이 폐지되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실상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리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
게다가 검찰이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면 넘겨야 한다. 공수처 조직 구성 방식으로 보아 그런 사건 역시 '엄정 처리'는 난망(難望)이다. 결국 특별감찰관 폐지는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리 은폐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얼마나 구리기에 이렇게까지 하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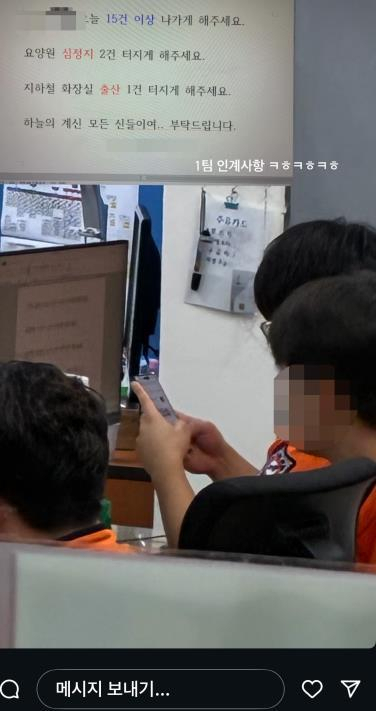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