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5천만 명 정도가 희생된 스페인 독감의 진원지는 스페인이 아니다. 미국 미시간주 일부 지역이 최초 발생지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그런데도 스페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차 대전 참전국들이 전시 보도 통제를 한 반면 비참전국인 스페인 언론은 집중 보도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억울하겠지만, 현재까지 이 명칭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2009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스페인 독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스페인은 UN에 '스페인 독감'이란 말을 쓰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쓰는 것은 그 명칭에 스페인 모욕의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로 국명을 붙인 경우는 있다. 16세기 초 유럽을 휩쓴 매독이 그렇다.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은 '프랑스 병'이라고 했고, 프랑스는 '이탈리아 병'이라고 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 병',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지칭해 '카스티야 병', 러시아는 '폴란드 병', 터키는 '기독교 병'이라고 했으며, 타히티에서는 '영국 병'이라고 했다.
지금은 이런 이름 짓기는 사라졌다. 최초 발생 또는 발견된 장소에서 많이 따오지만, 편의상 그럴 뿐이다. 6·25전쟁 때 발생했던 유행성출혈열의 바이러스는 한탄강 유역에서 잡은 등줄쥐에서 발견됐다고 해 '한탄'이란 이름이 붙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에서 따왔다. 이런 사례는 숱하다.
문재인 정부가 '우한 폐렴'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바꿔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것을 두고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싫어하는 데도 굳이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덥석 명칭을 바꾸는 것도 볼썽사납다.
정부가 지난해 '일본 뇌염'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일본 뇌염'은 옛 일본군 731부대 바이러스 연구담당인 가사하라 시로(笠原四郞)가 뇌염 바이러스를 1935년 최초로 인체에서 분리한 데서 유래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것에서 따왔다. 어디에도 '모욕'의 의도는 없다. '우한 폐렴'도 다를 바 없다. 발생한 지역 이름을 땄을 뿐이다. 중국만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뿐인데 왜 우리가 덩달아 깨춤을 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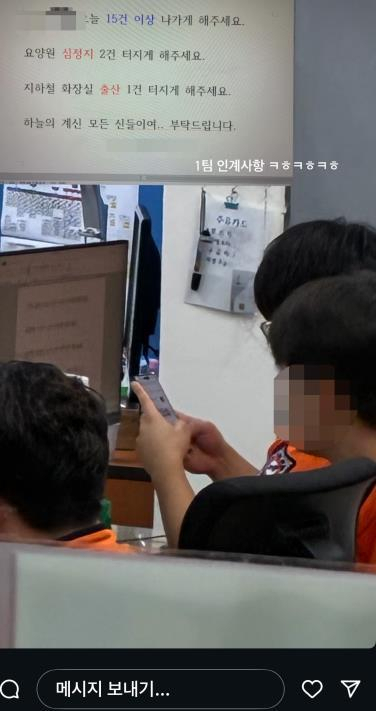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