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생'(寄生)이란 어떤 생물이 다른 종류의 생물체, 즉 숙주(宿主)의 속이나 표면에 살면서 그 생물의 영양분을 빼앗아 그 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동식물의 몸에 붙어서 병을 일으키게 하는 세균이나 균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 먹는 이나 벼룩, 사람 몸속에 살면서 해를 끼치는 회충 등이 그것들이다.
윌리엄 맥닐(William McNeill)은 '전염병의 세계사'(김우영 옮김)에서 미시기생(微視寄生)과 거시기생(巨視寄生)으로 기생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미시기생은 미생물을 포함한 기생체와 인간의 관계를, 거시기생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기생체와 숙주와의 관계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인간과 자연으로까지 확대한 맥닐의 통찰력이 놀랍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생산력에, 인간은 자연에 기생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은 거시기생의 한 단면을 극화하여 대성공을 이룬 쾌거였다. 힘이 센 자와 약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사회의 한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다. 2월 9일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에 올라 세계적인 흥행에 돌입할 무렵, 2월 20일 제작 및 출연진이 청와대로 초치되어 짜파구리 파티를 열 무렵,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기생충의 출현으로 잔칫상과 흥행에 재를 뿌린 격이 되고 말았다. 영화 '기생충'과 살아 있는 기생충의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우리네 인생사의 본래 모습인가?
그즈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사회는 '영악한' 기생충인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히 전 세계적으로 이것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것은 그 나름대로 매우 영리해서 늦봄까지 또는 초여름까지 기승을 부릴 태세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떻게 영악한가?
첫째, 이것은 꾀가 많아 숙주를 잘 죽이지 않는다. 숙주가 죽게 되면 자신들도 죽게 되므로 숙주를 적당히 괴롭히면서 넓게 퍼져 자신의 세(勢)를 키우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이제는 유럽 전역과 북미를 휩쓰는 '세계적 유행'(pandemic)에 이르렀으니 코로나19로서는 성공한 셈이다.
둘째, 이것은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며, 위장술까지 동원한다. 보통의 질병은 환자에게 증상이 발현된 후에 전염이 되지만 이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을 시킨다.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및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잠복기부터 감염시키니 속수무책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은밀하게 적에게 접근하듯이 이것 또한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은밀하게 다른 숙주에 침투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것은 재빨리 변신해서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정체가 분명해야 빨리 치료할 수 있는데, 유전자 변이를 통해 모습을 자꾸 바꾸므로 의학자들은 고정된 과녁이 아닌 이동하는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대구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심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전쟁 같았던 지난 한 달여 동안 대구경북인은 놀라운 이타심과 침착성, 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을 보여 국내외의 찬사를 받았다.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인의 품위(品位)를 세계만방에 자랑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코로나19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과 치료제까지 개발하여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꿈을 꿔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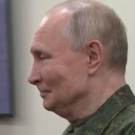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