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찐'
올해의 단어다. '코로나19'를 제외하면 말이다. 영탁의 '찐이야'부터 우리는 '찐'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제품은 찐입니다!" "그거 찐인가요?" "그 사람은 정말 찐이야" 등등 사람들은 이토록 '찐'이라는 단어에 목말라하고 있다. 문제를 뒤집어 보면 답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찐'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가짜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광고가 그렇다. '찐'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광고판의 햄버거 속 고기는 두툼하다. 마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듯하다. 주문 후 트레이 위의 햄버거는 앙상하기 그지없다. 정말 거지같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제로 칼로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름진 것과 함께 먹으라며 살찌는 죄책감을 덜어내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뇌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설탕이 분명 몸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뇌만 속이니 단 것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속고 속이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롱런하는 브랜드와 단명하는 브랜드의 차이가 난다. 바로 이 '찐'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미국 유학 시절의 일이다. 당시 나는 애틀란타에서 광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느 유학생들처럼 넉넉지 않은 상황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타벅스가 있었다. 거기서 라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당시 나는 학교 안 뷔페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월급날 꼭 스타벅스를 가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급여일, 월급봉투를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 스타벅스를 방문했다. 그리고 호기롭게 주문했다. 늘 왔던 단골손님처럼 말이다.
Can I get one cafe latte?
그렇게 받아든 따뜻한 카페 라떼는 마시기 전부터 맛있었다. 이미 나의 후각은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라떼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여유 있게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펼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책을 펼치는 못된 손 때문에 라떼가 바닥으로 쏟아진 것이다. 가슴 속에는 활화산 같은 용암이 분출했고 표정 관리는 기능을 잃었다. 세상을 다 잃은 기분으로 알바생에게 청소도구를 빌리려 했다. 그러자 그는 '그 정도쯤이야 껌이야'라는 표정으로 밀대를 가져와 바닥을 박박 훔쳐냈다. 미안해서 숨고 싶었고 허탈해서 도망가고 싶었다.
나는 한 달 뒤 월급날을 기약하며 알바생에게 "thank you"라는 말과 함께 등을 돌렸다. 그러자 이게 웬걸 점원은 이미 다른 라떼를 만들어 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라떼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다. 바닥에 라떼를 쏟아 가게를 더럽힌 가난한 동양인 유학생을 위해서 말이다. 방금 가슴 속에 뜨거운 용암이 분출했었는데 이번엔 뜨거운 눈물이 터질 차례였다. 그때 내가 다시 받아든 라떼는 인생 최고의 라떼였다. 2001년 8월, 군대 시절 행군하다 아스팔트 위에 잠시 쉬며 먹었던 이온음료와 견줄 정도였다.
아무리 광고판 속 라떼가 맛있어 보이면 뭐할까? 아무리 TV 광고 속 카라멜 마끼아또가 달콤해 보이면 무슨 소용일까? 나는 이미 스타벅스에서 이런 황홀한 마케팅을 경험했는데 말이다. 이 이상의 찐 마케팅이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이 아니라 경주서 벌어졌다. 서울에서 경주에 오셨다가 찰보리빵을 사간 고객이 있었다. 그런데 자기 집 베란다에 찰보리빵을 둔 사실을 깜빡하고 외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한참이 지나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찰보리빵은 이미 운명을 달리하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이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경주 찰보리빵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하소연을 했다. 너무 안타깝다고.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은 곧 바로 고객이 구입했던 똑같은 빵을 서울 집으로 배송했다. 가게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돈을 받고 그 만큼의 제품을 제공했다. 누가 봐도 공정한 거래였다.
하지만 사장님은 고객의 편에서 생각했다. '정당한 돈을 지불했지만 고객은 돈을 쓰고도 찰보리빵을 못 먹었다. 그러니 내가 똑같은 상품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재무제표상, 회계장부상 따질 수 없는 서비스를 베푼 것이다. 그 고객의 감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고객은 서울의 중소기업의 한 대표이사였다. 찰보리빵 한 박스라 해봤자 24,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대표님은 그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 100만원치의 찰보리빵을 주문한 것이다. 본인 회사 직원들도 그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그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그것은 눈덩이처럼 돌아온다. 진심에는 이자가 있다.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여럿이 함께 나타난다. 그것이 찐 마케팅의 힘이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런 '찐'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IMF 이후 최고의 불경기 속에 사는 우리는 그걸 더욱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다. 코로나 시대에 세일즈 전략, 코로나 시대의 트랜드,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와 같은 컨셉의 책들이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변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마케팅의 본질이다. '사람', '사랑', '고객'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코로나 시대에도 변치 않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바로 '찐'이다.
성경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작은 자에게 하려면 '찐'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심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이제 10초 뒤에 이 칼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도 고민해보겠다. 나는 정말 '찐' 광고인일까.


㈜빅아이디어연구소 김종섭 소장.
'어떻게 광고해야 팔리나요'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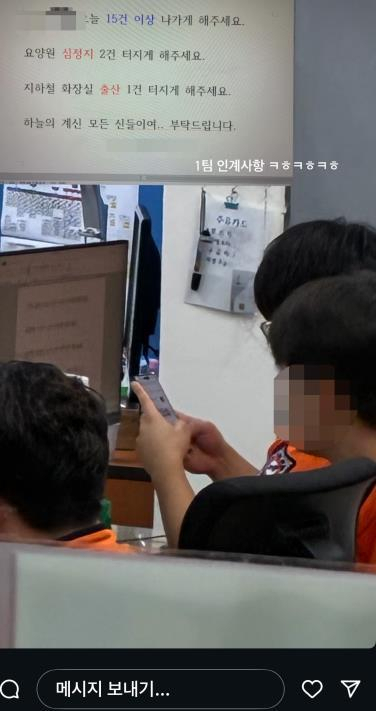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