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동화사에 현천스님을 만나러 갔었다.
스님이 웃으며 귀한 차 한잔 하잔다.
요즘 유행하는 전기포터가 방 한 쪽에 얌전히 놓여 있다.
스님이 포터를 전원에 꽂는다.
30초 안팎. 물이 끓는다.
끓는 물소리는 얌전치 못하고 순식간에 굉음을 낸다.
뿌연 김조차 모락모락 오르는 게 아니라 폭죽 터지듯 일시에 솟구친다.
스님이 찻잔에 차를 부으며 "이렇게 빨리 물이 끓는 게 희한하여. 그런데 나 이런 물로 굳이 차를 달여 마셔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퍼.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순식간에 펄펄 끓는 물에 우러나는 차가 진정으로 우리 몸에 이롭기나 할까?"이롭지 않다는 게 과학적으로 쉽사리 증명이 될 리 만무하다.
단지 그럴 것이란 막연한 짐작이지만 스님 말씀에는 한 구석 부정할 수 없는 요즘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걱정스럽게 묻어 있다.
스님이 애써 다소곳이 따라 준 찻잔 위에 묘한 감정이 흐른다.
감정이란 원래가 묘한 것. 지나치면 흥분되고 모자라면 짜증나고 알맞아도 결코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 무엇. 감정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 전차에서 마시는 세 모금의 차 맛. 첫 모금은 마음 속의 탐심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고 끝 모금은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각오로 찻잔을 당겼다.
마음이 한결 잔잔해 진다.
이렇듯 차 한 잔 속에는 마음들을 다스리는 도가 가득 들어 있다.
정민교수(한양대)의 '한시미학산책'이란 책에도 이에 버금가는 게 가득 들어 있다.
지금 한시라면 어딘가 시대에 뒤떨어진 잊혀진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아니다.
그동안 서양시론들에 둘러 싸여 진정한 한시의 맛과 멋을 모르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치고 한번 과감히 이 책을 펼쳐 보자. 특히 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한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해 온 글인가. 칭찬만 하려는 대목이 아니다.
그 현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익도 엄청남을 말하는 것이다.
선비들의 시 한 수가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했으며 숱한 곡절들이 명징하고 때로는 강렬하고 간혹 황홀할 정도다.
강직하고 애끓고 시공을 훨훨 나르는 상상의 폭은 또한 충분히 읽는 이의 가슴을 후련하게 메친다.
글자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일자사 이야기등 스물네 단락 이야기 전부가 하나하나 재미에다 각종의 의미가 색다르다.
한시에 대한 지은이의 풀이가 일품이다.
지은이는 이 글을 쓰는 동안 내내 시마(詩魔)에 붙들린 듯 다른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 한시를 둘러 싼 산문들은 시에 못지 않은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다.
여기다 연구하며 얻은 고사와 이론과 자료들을 엮어내는 솜씨는 단순히 한시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고전에 대한 매력과 우리고전의 지킴에 대한 애정이 물씬 배어있다.
隣家小兒來撲棗(이웃집 꼬마가 대추따러 왔는데)/ 老翁出門驅小兒(늙은이 문 나서며 꼬마를 쫓는구나)/ 小兒還向老翁道(꼬마 외려 늙은이 향해 소리지른다)/ 不及明年棗熟時(내년 대추 익을 때는 살지도 못할걸요). 이 시는 조선 중기의 시인 이달(李達)이 지은 '박조요(撲棗謠)', 즉 대추 따는 노래다.
파란 하늘아래 빨갛게 익어가는 촌가의 가을 풍경을 소묘한 것. 이웃집 대추가 먹고 싶어 서리를 하러 온 아이가 있고, "네 이놈! 게 섰거라"하며 작대기를 들고나서는 늙은이가 있다.
서슬에 놀라 달아나는 꼬마도 약이 올랐다.
달아나다 말고 홱 돌아서더니 소리 지른다.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4구는 "영감! 네년엔 뒈져라"가 된다.
그래야 내년엔 마음놓고 대추를 따먹을 수 있을 테니까. 늙은이가 아무리 잰 걸음으로 쫓아온다 해도, 꼬마는 얼마든지 붙잡히지 않고 달아 날 자신이 있었던 게다.
이달은 이러한 즉물적 풍경의 섬세한 초착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주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 책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렇듯 한시가 주는 매력에다 지은이의 풀이가 독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세상을 향해 던지는 힘이 넘치는 분노와 서릿발 같은 격정,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다를 수 없었던 상상의 파노라마까지, 그러다가 지금과 옛것과의 사이를 넘나들고, 그러다보면 자연히 위안을 받으며 현실로 돌아 오는 길목도 갖춰져 있다.
마치 한 잔의 차를 깊이 마셨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명나라의 다인 고원경(1542)은 그러나 차에는 음기라는 것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차의 성질이 차가움을 이르는 말이다.
특히 발효차나 증제차가 아닌 덖음차를 잘못 정제하면 음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음기, 즉 차독이 몸에 쌓이는 것을 다적(茶積)이라고 했는데 자칫 몸을 상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시미학산책'에는 그런 다적은 없다.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은 걱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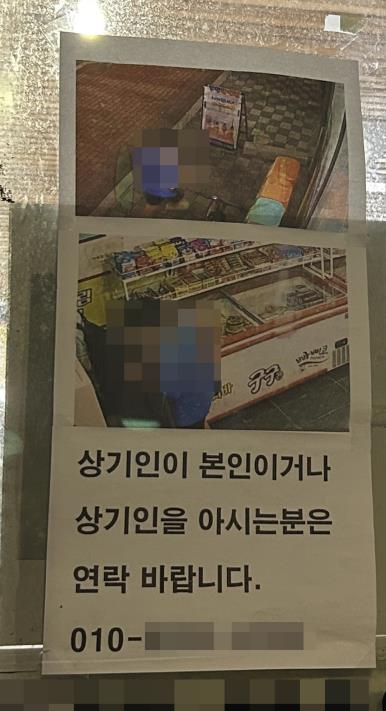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