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호란 때 청나라 대군에게 포위된 남한산성에서는 조선(朝鮮)의 운명을 건 논쟁이 벌어졌다. 이른바 주화파(主和派)의 최명길(이조판서)과 척화파(斥和派)인 김상헌(예조판서)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었다.
최명길은 청나라가 아무리 오랑캐 나라지만 명나라를 압도할 만큼 힘이 막강하므로 우선 머리를 숙이고 나라를 보전하자는 입장이었고, 김상헌은 비록 힘이 약해졌지만 임진왜란 때 도와준 종주국 명나라에 대한 대의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최명길은 전쟁의 종식만이 나라와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일념이었으며, 김상헌은 대의명분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신념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화와 척화, 즉 실리와 명분을 두고 갈라진 국론은 결국 화친과 항복으로 기울어졌고 최명길은 항복하는 국서를 작성해 청군 진영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김상헌이 이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그러나 최명길은 찢긴 국서를 다시 주워서 붙였다.
이때 나온 유명한 문구가 '열지자 불가무 습지자 불가무'(裂之者 不可無 拾之者 不可無)이다. 즉 '찢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고, 줍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같이 당대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은 청나라에 끌려가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주화(主和)도 척화(斥和)도 진정 애국애족이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애국(愛國)과 매국(賣國)은 그래서 이분법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정녕 나라와 겨레를 위한 것인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싸고 애국과 매국이란 말이 횡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협상을 이끌어온 누구는 '이완용'이 되었고, 반대를 위해 난폭한 행동도 불사한 누구는 자칭 '안중근'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애국과 매국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행위의 진정성이다. 과연 최명길과 김상헌처럼 자신의 경륜과 목숨까지 내건 주장이었던가. 스스로 애국애족이라 치장한 행위의 이면에는 혹여 자신의 해묵은 이념적 편향성이나 지지 세력을 의식한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이 깃들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조향래 북부본부장 bulsajo@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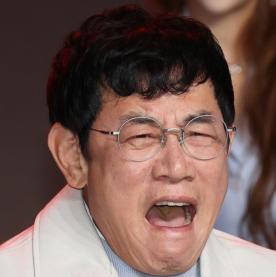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