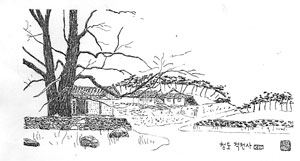
문정희 시인은 '치마'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치마 속에 확실히 무언가 있다/ 여자들이 감춘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참혹하게 아름다운 갯벌이 있고/ 꿈꾸는 조개들이 살고 있는 바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 허무한 동굴."
그러자 시인 임보는 '치마를 읽다가'란 부제를 단 '팬티'라는 시에서 이렇게 화답했다. "여자들의 치마 속에 감춰진/ 대리석 기둥의 그 은밀한 신전/ 남자들은 황홀한 밀교의 광신도들처럼/ 그 주변을 맴돌며 한평생 참배의 기회를 엿본다/ 남자들도 성지를 찾아/ 때가 되면 밤마다 깃발을 세우고/ 순교를 꿈꾼다/ 그 깊고도 오묘한 문을 여는/ 신비의 열쇠를 남자들이 지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그렇구나, 아침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읽은 시편들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네. 고추장을 퍼내 이야기를 만들려는데 이렇게 사정없이 달려들어 조개들이 살고 있는 바다 신전의 문을 여는 열쇠를 넘겨주는구나.
고추의 원산지는 멕시코다. 콜럼버스에 의해 1493년 스페인으로 전해져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동안 조미료로 쓰였던 후추보다 맵고 색깔이 붉어 붉은 후추(red pepper)라고 불렸다. 16세기에 일본으로, 17세기에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우리나라에는 광해군 때 일본에서 도입됐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을 독살시키기 위해 매운 고추를 가져왔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조선에 고추씨를 가져와 '고려후추' 또는 '왜겨자'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1775년에 나온 일본 사전인 '부쓰루이쇼코'에는 "고추는 조선에서 들여왔다"고 쓰여 있다. 이러쿵저러쿵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지만 확실한 유입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추가 어디에서 왔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고추가 들어가지 않는 양념이 없으며 장 담글 때는 숯과 함께 붉은 고추가 띄워져야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새끼줄에 고추를 끼워 대문에 걸어두었다. 또 고추는 풋고추 때부터 보리밥의 반찬으로, 막걸리의 안주로 애용되다가 완전히 익어 붉은 고추가 되면 마당의 멍석이나 초가지붕 위에서 몸을 말린 다음 김장 양념, 실고추, 고추장 재료 등으로 정말 귀하게 쓰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고추가 맡은 악역 중에 고춧가루를 푼 물을 코로 집어넣는 고문은 상상하기 힘든 형벌이다.
조선조 임금 중에서 식성이 까다로웠던 영조 임금은 고추장이 없으면 숟갈을 들지 않았다. 1749년 7월 24일의 승정원일기에는 "옛날 임금에게 수라상을 올릴 때 반드시 맵고 짠 반찬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지금 나도 천초(산초)와 같은 매운 것과 고추장을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영조는 궁 안에 있는 내의원에서 담근 고추장보다 궁 밖의 사부가(士夫家)에서 만든 것을 더 좋아했다. 영조 임금은 자신이 신임하는 영의정을 탄핵했던 전라도 순창이 고향인 사헌부 지평 조중부를 미워하면서도 그 집에서 갖고 온 고추장을 너무 좋아했다. 그가 죽고 5년이 지난 뒤에도 "그 집 고추장을 먹어 봤으면…"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러고 보니 순창 고추장의 역사는 꽤 오래된 것 같다. 나도 입맛이 없을 땐 전라도 장흥에서 사온 보리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다.
요즘 한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미국과 구라파를 비롯하여 세계로 번지고 있다. K-pop이란 음악뿐 아니라 의상과 음식까지도 한류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불고기와 김치를 넘어서 매운 고추장을 즐겨 먹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원 영조 임금처럼 고추장 없이는 빵과 고기를 못 먹는 파란 눈의 코쟁이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산부인과 병원 입구에 붉은 고추가 끼어 있는 왼새끼줄이 걸릴 날도 그리 머지않을 것 같다.
수필가 9hwal@hanmail.net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