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 초가 되면 전 세계 가전업계의 눈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쏠린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이른바 CES 때문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CES는 전 세계 3천250개 업체들이 17만여㎡(약 5만여 평) 넓이의 각종 전시장에서 170여 개국으로부터 온 15만여 명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쇼'를 펼쳤다.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4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올 한 해 가전업계의 판도를 미리 점칠 수 있는 총성 없는 전장이었다.
세계 가전업계를 이끄는 삼성과 LG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 CES에서도 단연 돋보였지만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를 옛말로 만들 정도로 중국 업체들의 성장은 눈부셨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본 업체들의 건재'였다.
◆삼성과 LG를 위한 전시회
세계 전자업계와 CES 참가자들의 관심은 삼성과 LG가 어떤 제품을 선보이는가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전시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산인해였다. 삼성전자는 총 4천596㎡ 규모로 참가업체 가운데 최대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진행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중심 건물인 센트럴홀 가운데서도 전면의 중앙에 자리 잡은 삼성전자관은 4일 동안 사람들로 넘쳐났다. 메인 전시관 밖에서 열린 갤럭시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나눠주는 코너에도 참관객들은 장사진을 이뤘다. '역시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충분했다.
LG전자 역시 행사 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둘째 날부터 관람객들에게 행사 참가 배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2천43㎡ 규모의 부스로는 찾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LG전자는 전시관 입구에 설치한 55인치 TV 122대로 만든 초대형 3D '비디어 월'을 무기로 관람객의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거세지는 중국 물결
CES는 주요 참가업체는 하이얼, TCL, 하이센스, 삼성, LG,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등 세계 가전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대표주자들이 센트럴홀에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이전에도 이들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올해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나선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고려하면 전자업종에서도 중국의 발전은 대세가 되었음을 나타냈다. 대기업의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한두 수 아래인 것은 분명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노력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창홍, 화웨이, 레노버 등 국제적으로 지명도를 높여가는 업체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공격적이었다. 전시장에 설치한 부스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 업체들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능가했다. '중국대세'를 절감하게 만든 것은 국제관을 뒤덮은 중소기업들이었다. 컨벤션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라스베이거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베네시안 호텔에 마련된 국제관은 중국관이나 다름이 없었다.
◆썩어도 준치 '재팬 파워'
CES 전시장의 배치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시내 베네시안 호텔에 추가 전시장이 마련된 형태였다. 물론 LG디스플레이처럼 별도의 고객 전용 전시'상담시설을 운영한 업체도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중심 전시 시설은 역시 컨벤션센터의 센트럴 홀이었다. 이 홀 전시업체들을 국가별로 나눠보면 역시 일본이 최대 면적에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 소니는 LG전자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파나소닉이나 카시오, 샤프, 도시바 등도 작지 않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부활을 위한 날갯짓에 열심이었다. 여기에 대기업 못지않은 브랜드 파워를 가진 중견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삼성과 LG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 대조적이었다.
또 일부 TV품목에서는 우리 업체들을 위협할 만한 제품들을 선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일본의 전자공업이 여전히 건재하고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우리 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대구경북도 세계로 가자
지역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를 통한 업체 9개가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 CES에 참가했다. 코트라가 지원하는 업체 37개와는 별도의 부스였다. 물론 이 전시관은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과 홍콩까지 가세한 중국세가 월등해 그 속에 파묻히는 현상이 불가피했다. 애초에 이 전시관을 잡은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한국과 대구를 알리려는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였다.
송인섭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전시회에서는 기업이든 기관이든 존재감을 빨리 알려야 한다. 내용을 알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번 CES에서도 어떤 식이든 대구를 알리고 테크노파크와 모바일융합센터의 존재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반면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너무 성의가 없었다. 굳이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CES 참가 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DGIST는 직원 나들이를 위한 구색용 참가에 그쳤다. 처음이 아니라는 DGIST의 이번 CES 참가가 어떤 목적과 그에 따른 성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내부의 엄격한 평가와 심사가 필요해 보였다.
글'사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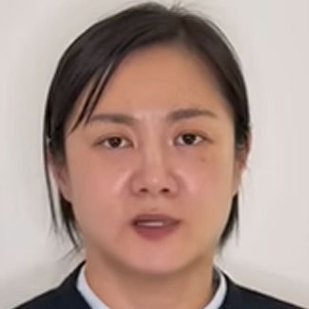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