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당시 친한 친구도, 나도 취업을 못한 상태였다. 이젠 어디 가서 소속을 댈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天下無敵)이 아닌 '천하무적'(天下無籍)이었다. 애써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어쩌고저쩌고' 웃으며 까불었지만, 속내는 한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갖던 청년 백수 시절이었다.
언론사 입사 시험에 내리 대여섯 번을 떨어진 친구는 잠시 머리를 식히겠다며 스터디 그룹을 관두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그 후 술자리에서 친구가 했던 말이 여태 잊히지 않는다. "나, 적어도 택시 운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게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든 제 생계를 제 힘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흠뻑 담긴 진담이었다. 그 말이 부럽기까지 했다. 당시 나도 신춘문예, 문예지 신인공모에 작품을 내는 족족 떨어지기 바빴다. 오지 않는 당선 소식을 기다리다 좌절하기 일쑤였던 그 어두운 시절, 나 또한 '택시 운전'과 맞먹는 생계 수단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도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알음알음으로 잘나가던 번역자를 만나서 테스트를 통과하고 번역물 하청을 받았다. 내 이름으로 나간 첫 번째 번역물은, 미국 대중작가 자넷 데일리의 로맨스 소설 '넝쿨'이었다. 그 책을 세상에 내보내고 나니, 소설가로 등단을 하든 못하든 비빌 언덕을 가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어찌나 뿌듯하던지 모른다.
친구는 결국 기자가 되어 필명을 날리고 있었지만, 택시 운전사가 되었더라도 길을 잘 읽고 손님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훌륭한 운전사가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운전 경력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쯤에는 기자의 꿈을 키우며 갈고 닦은 비평적 시각과 운전하면서 체험한 인간사의 애환을 공교로이 버무려 홍세화 씨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 버금가는 명저를 내지 않았을까?
나 역시나 끝내 등단하지 못하고 번역가로 남았어도 최고의 번역가는 못 되었을지언정 평생 노력하는 번역가는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려도 친구로서 존경하는 음악인 정민아 씨는 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국악관현악단 등의 입단 오디션에서 연거푸 떨어지자, 생계를 위해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제일 오래 한 일이 콜센터 상담원이었는데, 음성이 좋고 성격이 밝다 보니 그 일로도 꽤 인정받는 축이었다고 한다. 결국 음악에 대한 갈망은 홍대 인디클럽 쪽으로 진출해 '모던 가야그머'라는 이름으로 독특한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풀었다. 현재는 앨범을 꾸준히 내고 이름도 제법 알려져 전업 음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음악을 못했으면 무얼 하고 살 거 같으냐'고 묻자, "아마도 콜센터에서 열심히 일해 주임으로 승진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그런 거다, 인생이란? 그런 거다. 본인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판타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목숨 걸지는 말고' 내 열정과 노력이 닿는 데까지 애써 본 다음,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다. 그 다른 방식이 애초에 가고자 했던 인생길보다 못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으랴. 인생이란 그런 거다.
바야흐로 졸업 시즌이다. 기성세대로서, 더구나 청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졸업생 제자들의 얼굴을 마주 보기가 참으로 민망하고 죄스럽다. 새 대통령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전국의 대학 졸업생 모두가 흡족한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지만, 앞서 말했듯, 본디 바라는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게 인생인 걸 어찌하랴? 그저 우리 젊은이들이 탈무드에서 조언하듯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하라며, 저마다의 마음 밑바닥에 똬리 튼 불안에 심장을 파 먹히지 않기를 빌고 또 빌 뿐이다. 인생이란 그런 거다.
박정애/강원대 교수·스토리텔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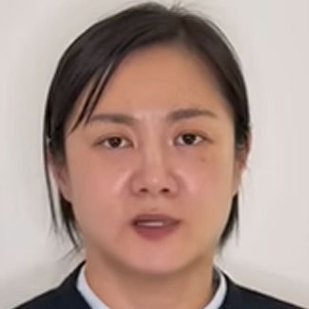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