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나는 친구와 맛있는 비지찌개를 먹었다. 변두리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였다. 맷돌로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 비지를 내는 집이었다. 그 비지찌개에는 우선 고기가 들어 있지 않았다. 조미료도 물론 쓰지 않았다. 갓 짜낸 비지 맛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양념만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허겁지겁 비지를 퍼먹는데 열중했다. 간이 짜지 않고 삼삼하여 먹다 보니 밥보다 비지를 더 많이 먹었다. 밥을 반찬 삼아 비지를 밥처럼 먹은 꼴이 되었다.
"있잖아, 내가 새댁이었을 때…."
반쯤 먹고 난 후 정신을 차린 내가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에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있어 집안에는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교실에서 바로 시댁으로 골인한 나는 밥도 제대로 못 하는 솜씨로 거의 매일 손님을 치러야 하는 형편이었다. 믿을 곳이라고는 오직 요리책뿐이었다. 나는 요리책을 우상처럼 신뢰했고 의지했다.
어느 겨울 나는 비지찌개에 도전했다. 방게를 넣은 고급 비지찌개였다. 요리책에 쓰인 대로 새로운 비지찌개가 탄생한 것이다. '쇠고기가 든 비지찌개는 더러 있지만 방게를 넣은 비지찌개는 새로운 시도'라고 요리책은 흥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새로운'이 나에게는 그렇게도 매혹적일 수가 없었다. 나는 손님으로 오신 시할머니의 친구들께서 나의 새로운 요리에 감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손님 중 한 분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손님은 나에게 빈 그릇 하나를 청했다. 그리고는 꼼꼼하게 방게에서 비지를 털어내더니 나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게에는 비지를 넣는 게 아니야. 음식이 지저분해져 버렸잖아? 게는 게로 먹어야지."
나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손님의 눈에는 내가 게탕을 맛있게 끓이려고 비지를 넣은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주(主)와 부(副)가 완전히 뒤바뀐 꼴이었다. 나는 손님이 빈 그릇에 긁어모은 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조차도 헷갈리는 상황이었다.
나의 요리는 게탕이었던가, 비지찌개였던가? 손님은 다시 한 번 다짐을 두었다.
"게는 게로 먹어야지. 비지는 비지로 먹어야 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 '묵은 김치 맛있게 먹어치우는 법'을 읽다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거기 또한 어김없이 돼지고기 100g이 등장하고 있었다. 나는 또 먹어 치워야 하는 묵은 김치와 돈 주고 일부러 사야 하는 돼지고기 중 어느 것이 주 음식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손님을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고.
에세이 아카데미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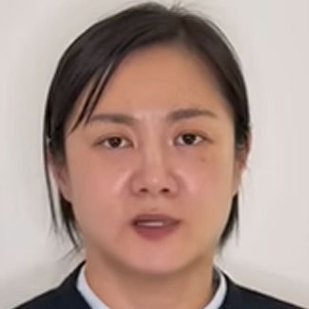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