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읽기에 관해서,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좀 유난스런 버릇으로 평생 고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건 빌린 책은 도무지 조심스러워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린 책을 펼치면 글자들이 눈으로 쏙쏙 들어오지 않고 벌레처럼 꼬물꼬물 기어 달아날 뿐 아니라, 그 글 뒤에 버티고 있는 작자한테 마음 놓고 장난을 걸 수가 없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아예 돈을 주고 사서 멋대로 밑줄을 굵게 혹은 가늘게 분별하여 긋거나, 중요한 개념어는 네모 칸으로 가둬 여백으로 옮겨도 보고, 또 머릿속을 갈아엎는 빛나는 문장을 만나면 그 옆에다 별을 두서너 개씩 그려가며 읽습니다. 그래야 책과 깊이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작자와 씨름하는 맛이 납니다.
일단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 책 욕심은, 까마득히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책값을 타내던 때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오십육칠 년 전,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의 일로 기억되는데요. 어느 가을날 아침, 교실로 들어오신 선생님께서 화려한 표지의 책 한 권을 펼쳐보이며, "너희들이 보는 어린이 잡지야. 우리 반에 한 권이 배당되었는데, 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사주실 사람 없을까?" 하시며 아이들을 둘러보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란 직후의 모든 게 궁핍하던 시절이라, 십 리나 되는 등하굣길을 허기져 걸어다니던 산골 아이의 책보자기 안에는 교과서 두어 권과 공책, 그리고 몽땅 연필이 나무필통 속에서 딸그락거릴 뿐 읽을거리 또한 절대적으로 빈곤하였지요.
지금도 아련하게 생각납니다. 교과서 사이에 그 잡지를 소중히 간추려 놓고 몇 번이나 확인한 후 책보자기에 싸서 집에 오자마자 펼쳐보았던 그 책. 확 풍겨오던 잉크냄새. 총천연색 그림과 사진이 살아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신비스런 시가 흘러나오고, 처음 보는 만화 속의 키득거리는 웃음까지 가득 담겨 있던 그 책. 어린 산골 소년에게 그건 책이 아니라 아름다운, 멋진, 꿈의 신세계였지요. 호롱불 아래서 정신없이 그 책 속에 빠져들었던 그날 저녁은 제 생애에 있어서 참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게를 지고 삽짝을 나서는 아버지께 책을 보여드리고 수업시간에 배우는 책이라 모든 아이들이 다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꾸며대며 책값을 말씀드렸을 때, "공부하는 책인데 무슨 만화까지 있노?" 하시면서도 선뜻 책값을 내어주시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책을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 눈감아주셨겠지요. 그리고 당신께서, 고단한 농사일만이 사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듯 장날 쟁기날과 같은 농기구와 함께 사온 구운몽이나 옥루몽을 밤마다 즐겨 읽으셨듯이, 어린 제게도 교과서 밖의 풍경을 넌지시 열어 허락해 주시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오면서도 학교 공부 이외의 세상에 곁눈질이 잦다 보니 잡다하게 사 모은 책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만 시골학교에 발령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답답하던 시골 하늘을 탈출하는 길은 오직 책뿐이라는 오기라도 부리듯, 학교로 월부 책장수가 찾아오면 전집으로 책을 들여놓고 그 책값 불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책을 사들이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시골집 제 방에는 온갖 책들이 무더기로 쌓여 이리 무너지고 저리 넘어져 어지러웠는데, 그런 책무더기처럼 제 머릿속도 설익은 생각들로 어지러워지면서, 시골 선생 노릇이 답답하기만 하여 한 번씩 짜증이 날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짓거리로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게 또 당신 탓이라는 듯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 큰 책장을 들여놓아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지요. 안계장터 대목한테 일부러 맞추셨다는 그 책장은 앞면에 유리창까지 달려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책장을 갖게 된 것이 책을 소유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바닥에 뒤죽박죽 쌓여 있던 책을 종류별로 책장에 정리하면서, 난독으로 난삽하게 얽혀 있던 제 머릿속도, 아니 주체할 수 없는 열병으로 좌충우돌하던 제 젊은 시간도 서서히 교통정리가 되어갔으니까요.
한평생 산골짜기 다랑논을 지게에 지고 다니시면서도 제 손에는 낫이나 호미보다 책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아버지. 책을 가까이하는 삶을 허락해주셨던 아버지의 생애가 제게는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는 단 한 권의 두꺼운 고전(古典)입니다. 지금은 고향 마을 뒷산의 잔설(殘雪)을 베고 누워 하얀 낮달 하나 하늘에 띄워 놓고 홍길동전이라도 읽고 계실, 아- 아버지….
김동국/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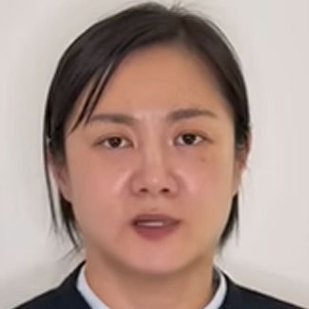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