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히는 매혹적인 달빛이 원시 인류에게는 무한한 동경과 공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로 규칙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달의 형상은 틀림없는 시계이기도 했다.
하루의 개념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보름의 주기는 달이 차올라서 이지러지는 모습을 주시하면서 감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달이 12번 차고 기울면 계절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한 달과 1년이란 시간 개념이 생성된 것이다. 인류가 태음력을 먼저 사용하게 된 배경이다.
과학의 시대이자 종교개혁의 시대였던 16세기의 유럽.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흘이 로마의 역사에는 없다. 달력에서 이 기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레고리력 이전에 사용하던 율리우스력은 현대 달력보다 1년에 11분 14초가 더 길었다. 그것이 누적되면서 16세기에 들어서는 달력과 천문학적인 춘분 사이에 열흘이라는 차이가 생기면서 비롯된 일이다.
새천년 벽두에 나온 '달력과 권력'이란 책은 숱한 달력의 역사 속에 감춰진 권력과 과학의 충돌 그리고 인습과 혁신의 갈등을 보여준다. 기본 주기를 달의 삭망(朔望)에 두면 태음력, 태양의 운행에 두면 태양력이 된다.
최초의 실용적인 역법은 나일 강의 범람을 관찰한 이집트인이 만들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1천 년 이상 사용된 달력은 율리우스력이다.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 역법을 수정 보완해 만든 것이다. 실제 시간과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윤달이 도입된 것도 이때이다.
그런데 율리우스력도 천문학적인 계산보다 약 10일이 빠른 오차가 생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 10월 5일부터 열흘을 삭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거쳐 개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다. 우리나라는 양력 189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 태양력을 채택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금테두리를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그 달력은 필요가 없다"며 '헌 달력 무용론'을 피력했다. 시대 상황에 맞춰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대통령과 권력 주변에는 헌 달력을 장식했던 철 지난 정치인들이 득실거리니 이를 어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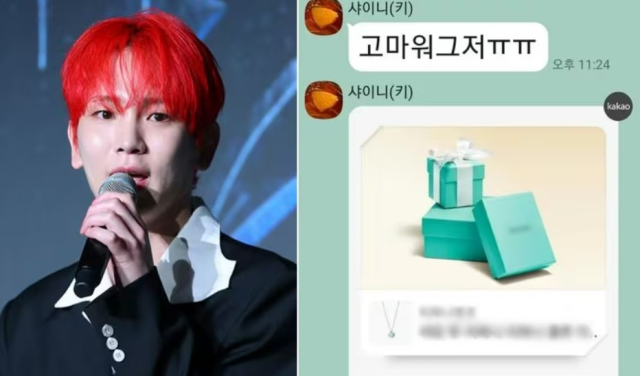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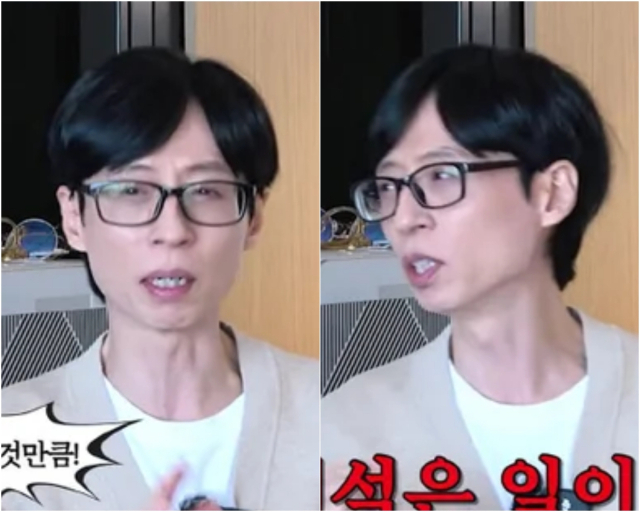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