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버지의 종교는 아교,
하루도 아니고
연사흘 궂은 비가 내리면
아버지는 선반 위의 아교를 내리고
불 피워 그것을 녹이셨네 세심하게
꼼꼼하게 느리게 낡은 런닝구 입고 마루 끝에 앉아
개다리소반 다리를 붙이셨다네
술 취해 돌아와 어머니랑 싸우다가
집어던진 개다리소반……
살점 떨어져나간 무릎이며 복사뼈며
어깻죽지를 감쪽같이 붙이시던 아버지, 감쪽같이
자신의 과오를 수습하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 내 아버지의 종교는 아교!
세심하게 꼼꼼하게 개다리소반을 수리하시던
아교의 교주 아버지 보고싶네
내 뿔테안경 내 플라스틱 명찰 붙여주시던
아버지 만나 나도 이제 개종을 하고 싶다 말하고 싶네
아버지의 아교도가 되어
추적추적 비가 오는 아교도의 주일날
정확히 무언지도 모를 나의 무언가를 감쪽같이 붙이고 싶네
-시집 『나는, 웃는다』 창비, 2006.
잘 만들어진 영화는 관객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한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므로 관객들이 공감해서일 것이다. 시도 그러하다. 이 시의 웃음의 요소는 접착제 아교를 종교의 이름으로도 여기는 언어의 유희일 것이다.
지리산의 어떤 얼치기 도사는 누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내비도'라고 해서 이웃들이 그를 내비도 교주라 부른다. 갈등 없는 인생사가 어디 있으랴. 술만 마시면 상을 부수고 다시 아교로 붙이는, 싸우며 다시 화해하며 사는 서민들의 진솔한 삶이, 풍요를 누리는 계층의 삶보다 오히려 건강하게 느껴진다. 우리 모두 가난했던 시절의 이런 풍경화도 추억 속에만 있다.
권서각 시인 kweon51@ch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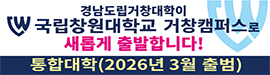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