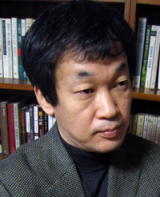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즉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거리
언마는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이여
바람 센 오늘은 더욱 너 그리워
진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오 너는 어디메 꽃같이 숨었느뇨.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뭍같이 까딱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2편 모두 전문. 『유치환-한국현대시문학대계』. 지식산업사. 1981)
'그리움'의 어원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그림', 나아가 원시인들이 동굴 벽에 간절한 무언가를 '긁음', 더 나아가 (재야 언어학자 천병석의 이론에 의하면 수메르어에서 기원한) 태양을 뜻하는 (k)al-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그리움의 기원은 자연의 공포 앞에 놓인 원시 인간들이 컴컴한 동굴 속에서 밝은 태양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그 재현 의식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움은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대상을 지향한다. '임'의 '얼굴'은 과거에 내 앞에 있던 대상이다. 허구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임의 얼굴을 마음의 벽에 긁어서 그린 그리움은 사실이 아니라 비슷한 재현일 뿐이어서 그 또한 허구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허구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움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 대상을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과 마주했던 과거의 내 마음의 공간을 재현하기 위해서일지 모른다. 그를 사랑했던 그 순간의 빛과 향기, 그와 이별했던 그 짜릿한 눈물의 맛 등등. 그런 의미에서 그리움은 자기 충족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자기 충족적 그리움으로 하여 잊힌 과거들이 먼지를 털고 우리 앞에 유령처럼 나타난다. 그 유령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우리를 어디론가 달려가게 득달한다.… 어찌할까, 읽히지 못한 저 많은 그리움들을!
시인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