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신자들은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면 신부를 찾는다. 병자성사라고 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예식이 있는데 그것을 청하는 것이다. 다른 업무는 대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만큼은 응급을 요하는 일이라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출동해야 한다. 그런 연고로 병원의 응급실은 자주 가는 장소이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애처로운 북새통에도 제법 익숙한 편이다. 빈사의 상태로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긴 채 누워있는 이들을 일반 사람보다 많이 보아왔지만, 정작 필자가 그 입장이 되어본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지난주까지는 말이다.
갑자기 체한 것처럼 속이 거북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진 것은 모처럼 일이 없어 친한 신부들과 함께 늦여름의 바깥 공기를 즐기던 지난 월요일이었다. 좀 쉬면 나으려니 했지만 이내 갑갑함은 격통으로 변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식은땀이 나면서 앉아있기조차 힘들어졌다.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었다. 천만다행으로 함께 있던 동료들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신부가 있어, 위급한 상황임을 알아보고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의 창 너머로 눈에 익은 대구 시내 경치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하고 생각했지만,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의 재빠른 처치로 감사하게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희한한 것은 쓰러지고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약 두 시간 동안 한 번도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덕분에 '죽어가는 경험'을 꼼꼼하게 할 수 있었다.
심장마비로 죽을 때는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통증이 정말 심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숨이 옅어지고 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감각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 그렇게 아프고 무서운데도 정신은 또렷해서, 동맥에 관을 삽입하고 혈관확장 시술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었다. 그중에 스스로도 기가 막혔던 생각은, '새 차를 사고는 석 달도 못 타보는구나'하고 아쉬워했던 것이다. 죽는 마당에 차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끼면서 철이 조금 들었는지, 의식의 초점이 차츰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명함이며 통장은 벌써 남의 일이고, 업적이나 평판도 마지막 순간에는 의미가 없었다. 끝까지 남은 생각 하나는, '짧은 인생 나그넷길에서 만난 사람들, 과연 얼마나 정성을 다해 사랑했는가?'라는 반성이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단 한 가지 확실한 미래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라틴어 격언에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이 있는데,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사느라 바쁜데 죽을 걱정을 노상 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가끔씩은 이 불편한 진리를, 언젠가 이 숨이 멎을 것이라는 인식을 마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죽음은 허망한 겉치레들을 다 벗겨내고 사람을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 예습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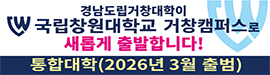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