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은 사랑의 산물? 천만의 말이다. 결혼은 계급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연애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미국 학자들의 이야기다. 미 미네소타대 법대 학장 존 카르본 교수와 조지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오미 칸 교수가 쓴 책 '결혼시장'(Marriage Markets)에서 맺은 결론이다.
두 저자는 소득과 결혼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그리고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관관계란 말을 만들어냈다. 어렵게 꼬아 놓은 말이지만 쉽게 풀어쓰자면 돈은 결혼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이 둘에 따르면 돈 벌어오는 아버지와 살림하는 어머니, 자녀 두세 명이 교외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던 그런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모습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 혼인 연령대는 높아지고 결혼율은 떨어지고 있다. 덩달아 출산율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과거 '보편성의 상징'이던 결혼은 소득을 매개로 한 '계급'이란 개념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미국이 이럴진대 우리나라라고 다를 리 없다.
이는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서 새삼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판 '결혼시장'을 웅변한다.
20, 30대 남성노동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00%가 결혼한다. 반면 대졸자라면 47.9%, 고졸자라면 39.6%만 결혼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모두 결혼하지만 고졸이라면 10명 중 4명만 결혼 문턱을 넘는 것이다. 학력은 당연히 경제력과 연결된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율도 높아진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기혼자 비율은 53.1%인 반면 비정규직은 28.9%에 그쳤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남성 근로자는 월평균 279만5천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149만4천원밖에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은 53% 수준에 불과하고 결혼율 역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돈이 없거나, 벌이가 시원찮다면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다.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대대손손 이어가며 존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돈으로 매겨지는 계급을 부수지 않거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결혼시장은 생성되어서는 안 될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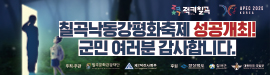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나경원 "한미 협상 분납은 선방 아냐…리스크만 길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