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꽃을 보면 정겹다. 집 앞 너른 논에 온통 감자 이파리가 너풀거렸으나 꽃대는 올라오자마자 수난을 당했다. 할머니 눈에 뜨이는 꽃대는 이내 꺾였다. 꽃에 영양분을 빼앗기면 감자가 굵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할머니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 드문드문 피어난 감자꽃은 반갑기 그지없었다. 원색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은, 독특한 색깔과 자잘한 꽃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면 숨소리마저 멎는 듯했다. '하얀 꽃 피면 하얀 감자로/ 자주 꽃 피면 자주 감자로'라는 어느 시에서 '꽃과 뿌리가 일체인/ 정직한 순종의 꽃'이라는 말에 무한정 끌렸다.
앞 논에서 캔 감자의 양은 어마어마했다. 고깐에도 떠럭에도 감자가 쌓였다. 안채 마루 밑에도 감자를 그득하게 밀어 넣은 후 나무토막을 쟁여 봉당과 경계를 지었다. 캐다가 흠이 난 감자와 알이 작은 감자는 여러 개의 옹자배기에 담아 우물가 옆에 나란히 줄을 세웠다. 할머니는 수시로 물을 붓고 갈아주며 감자 상태를 점검했다. 쿰쿰한 냄새가 몇 날 동안 진동했다. 잘 우린 감자 앙금은 건조 과정을 거쳐 '감자 농마'로 탄생했다. 조부모님과 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북도 산악 지방에는 메밀 농사마저 어려워 감자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할머니 고향에서는 감자전분을 녹말이라 하지 않고 농마라고 하였다. 농마는 겨우살이에 요긴한 식품이었다.
검은 빛깔의 감자 농마 송편은 우리 집에서만 맛볼 수 있었다. 이웃들은 별식을 먹으러 들리곤 했다. 회색빛 농마를 익반죽하여 팥소를 듬뿍 넣은 후 꾹꾹 두어 번만 움켜쥐면 송편이 만들어졌다. 할머니표 북한식 감자송편은 크기도 만만찮았다. "한 개를 먹어도 큼직한 게 좋니라." 쪄낸 송편은 색깔이 검었다. 색감도 그렇거니와 너무 찔깃한 식감이 어린 입맛에는 그다지 탐탁지 않았다. 달짝지근한 팥소만 골라 먹고 나면 가죽 부대마냥 껍질만 덩그마니 남았다. 농마 송편이 굳기 시작하면 조개가 아가리 벌리듯 떡떡 갈라졌다. 볼품없는 모양의 떡을, 손주들이 먹다 남긴 것을 할머니는 알뜰하게 드셨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친정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고향음식으로 달랬으리라.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과 그래도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늘 흔들리는 좌표였을 것이다.
할머니는 음식을 술렁술렁 만들었다. 특히 감자 요리를 즐겼다. 감자에 푸성귀를 넣고 고추장을 풀어서 끓인 감잣국, 간장과 고추장으로 번갈아 양념해서 만든 감자볶음, 둥글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서 구운 감자전, 고등어를 넣어 이삼 일 정도 은근하게 불을 지펴 마련한 감자 졸임 등,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집 밥상의 단골메뉴가 감자였다. 특히 햇감자가 한창일 때는 날마다 감자를 쪄주었다. 햇감자는 옹자배기에서 몇 번만 굴리고 주무르면 이내 연한 껍질이 훌러덩 벗겨졌다. 가마솥에 감자를 안치고 사카린과 약간의 소금을 넣은 후, 감자밭 고랑에 드문드문 심었던 완두콩을 넣었다. 분이 하얀 감자를 툭툭 으깨어 밥그릇에 담아주던 할머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자'로 우대받던 감자가 수확철을 맞아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예전의 순수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감자송편을 만들 수 없음이 안타깝다.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팍삭하게 분이 나도록 쪄낸 감자는 아니지만 할머니 솜씨를 흉내 내어 본다.
tip: 감자는 쌀보다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한 염분 배출을 도와준다. 감자를 찌는 과정에서 젓가락으로 두어 군데 찔러주면 빨리 익는다.
노정희 요리연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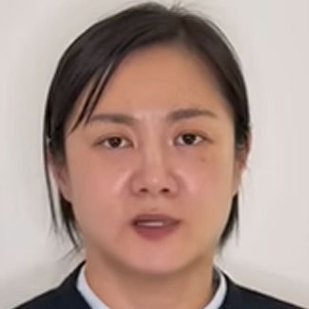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