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든 영화 '기생충'이 지구촌을 강타했다. '반지하'라는 가장 한국적인 공감각이, '봉준호'라는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동으로 승화되었다고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대구는 더하다.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의 세계 영화 시장 석권이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봉준호 감독이 대구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구의 아들이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위업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안간힘이다. 4·15 총선 예비후보들의 봉준호 관련 공약과 논평도 백화제방이다. 특히 봉 감독이 나고 자란 남구를 지역구로 둔 정치 지망생들이 이를 간과할 리가 만무하다. '봉준호 기념관' '봉준호 공원' '봉준호 거리' '봉준호 동상' 건립 공약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다.
'기생충 조형물'과 '봉준호 타운' 조성 제안까지 등장했다. '봉준호'를 팔아서 나올 만한 공약들은 다 나온 셈이다. 이만하면 대구가 '봉준호 백화점'이라도 될 기세이다. 이 영화가 세계인의 공감과 찬사를 끌어내며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자본주의의 승리 실증'과 '자본주의의 병폐 방증'이라는 엇갈리는 논평도 나왔다.
이들이 평소 영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봉준호'와 '기생충'을 얼마나 기억할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동상을 만들고 기념관을 세운다고 문화예술이 진흥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출신 유명 문인들의 문학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문학이 더 성숙해졌는가. 문학은 고단한 시절에 더 꽃을 피웠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꼴이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김광석길'의 상업화와 뜬금없이 불거져 나온 '이태원길'의 모호성만으로도 충분하다. 한때의 호들갑만으로 대구를 영화의 메카로 만들 수는 없다. 대구를 영화의 도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관심과 고민이 어우러져야 한다. 전시행정이나 정치적인 구호가 문학적 감성과 예술적 취향을 발현시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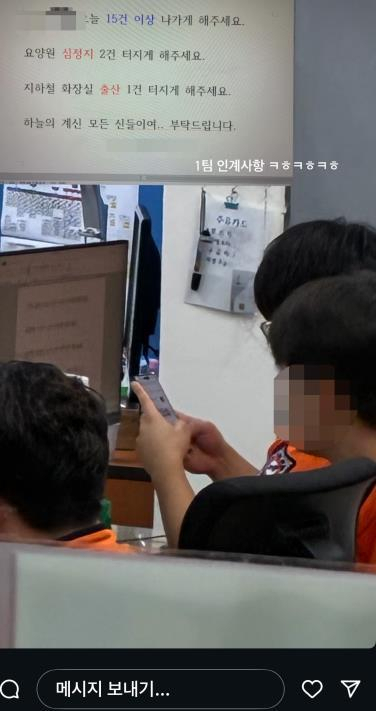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