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대구는 달벌(達伐), 달구벌(達句伐), 달구화(達句火), 달불성(達弗城), 대구(大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불'과 '벌'은 평야나 취락을 뜻하며, '달'은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을 큰 언덕, 넓은 평야, 넓은 촌락으로 해석할 수 있어 현재의 대구 지명과 같은 의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달구'가 '닭'이 연음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대구를 닭과 연관 지워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경주의 계림(鷄林·닭 수풀), 월성(月城)을 달구벌(대구)의 닭(달구)과 달성(達城)에 연계하여 경주와 대구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경덕왕 16년(757년)에는 신라의 모든 행정 지명이 당나라 지명체계 방식을 본받아 바뀌게 돼, 달구벌도 현재의 지명인 대구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의 한자어인 대구(大邱)와는 다른 한자어인 대구(大丘)였다.
결국 달구벌에서 '벌'을 버리고 대구로 개칭했지만, 지명 속에 녹아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큰 언덕(산)과 들판, 즉, 팔공산과 비슬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분지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대구의 지형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구(大丘)의 한자어가 지금의 한자어인 대구(大邱)로 바뀌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대구(大邱)라는 한자어가 등장한 시기는 정조 3년(1779년) 5월부터이다. 현재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구(大邱) 지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면 다소 기분이 씁쓰레하다. 대구 한자 지명의 변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어 '조선왕조실록'(영조: 26년 12월 02일: 신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대구(大丘)의 유학(幼學) 이양채(李亮采)가 글을 올렸다. "저희들은 영남의 대구부(大丘府)에 살고 있습니다. 국초부터 대구부 향교에서 공자님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춘추의 석전제(釋奠祭)에는 지방관이 초헌(初獻)을 올리며, 축문식(祝文式)에 별 생각 없이 '대구 판관'(大丘判官)이라 씁니다. 그런데 '대구'(大丘)의 '구'(丘)는 공자의 이름자인데, 신령 앞에서 축문을 읽을 때, 공자의 이름자를 범해 민심이 불안합니다." 그때, 상소문을 묵묵히 듣고 있던 영조 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 상소문 내용을 들으니 대구 유생이 고을 이름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 유생(儒生)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깊지 못한가? 300여 년 동안 대구부에 많은 선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양채 한 사람만 못해 말 없이 살아왔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조선에는 상구(商丘)와 봉구(封丘)란 지명들이 아직도 있지 않느냐? 어찌 옛 선현(先賢)들이 이를 깨닫지 못해 그러한 지명들을 그대로 두었겠는가?" 하면서 그 상소문을 돌려주라고 하였다. 당시 영조 임금의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유생들의 다소 사대주의적인 사고로 인해 정조 임금 당시에는 대구(大丘)와 대구(大邱)가 혼용되다가 철종 이후부터는 대구(大邱)로 고착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구(大邱) 지명을 신라 경덕왕 때 달구벌에서 개칭된 한자 지명인 대구(大丘)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대구 지명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구 지명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또한, 한글이 같아 큰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옛 한자 지명으로 복원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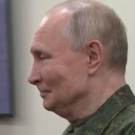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