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은 물론 중국의 역대 왕조는 그 수명이 200년 정도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려 500년에 이어 조선 500년이라는 독특한 기록을 세웠다.
이는 고려조의 양리(良吏), 조선조의 청백리(淸白吏)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선조의 청백리는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위한 제도였다.
청백리로 녹선(錄選)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의 2품이상 관원과 대사헌, 대사간 등이 심의를 맡았으며, 왕의 재가를 얻어 최종 결정됐다.
청백리로 녹선되면 자손들도 음덕을 입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숙종 이후로는 청백리의 자손이 너무 불어나 대개 5명 정도가 특채되었다고 한다.
▲조선 개국 후 순조 때까지 청백리에 녹선된 사람은 200명 안팎이다.
자료에 따라 적게는 157명, 많게는 218명~228명으로 적고 있다.
이처럼 청백리가 드물었던 것은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이다.
기본조건인 청렴결백은 물론이고 인품, 경력, 치적 등이 모든 관리의 표상이 될 수 있어야 했다.
요즘 말로 인격과 능력을 고루 갖춘 CEO여야 했던 것이다.
청백리의 반대개념인 탐관오리가 악리(惡吏)인 동시에 무능리(無能吏)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황희, 맹사성 같은 청백리를 배출했던 세종대왕 대는 관기가 특히 엄정했다.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하자 글 읽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시중에서 종이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세종은 조지청(造紙廳)을 세워 수요를 충당했지만, 고급품은 여전히 품귀상태였다.
어떤 선비가 조지청 종이를 얻어 쓸 궁리를 하다 조지청장의 애첩을 통해 종이 한 권을 몰래 빼낸 일이 있었다.
이 일이 발각되어 조지청장은 파직되고 다시는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엄정한 관기도 세월 따라 부침을 거듭, 19세기 이후에는 각 지방에 파견했던 암행어사까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3년 청관 10만금(三年淸官 十萬金)'이란 중국 속담이 말해주듯 어디를 가나 관리의 부패속성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아무리 청렴결백한 관리라도 3년이면 10만금을 손에 쥐게된다는 세간의 풍자가 청백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얼마 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어제는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뇌물수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정권의 암행어사(?) 두 명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면 당시의 국정 문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요즘 암행어사들은 그때보다 좀 나아졌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박진용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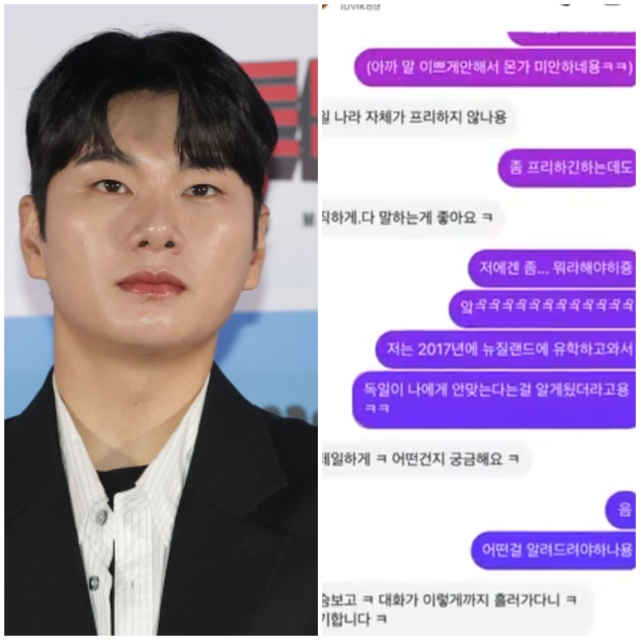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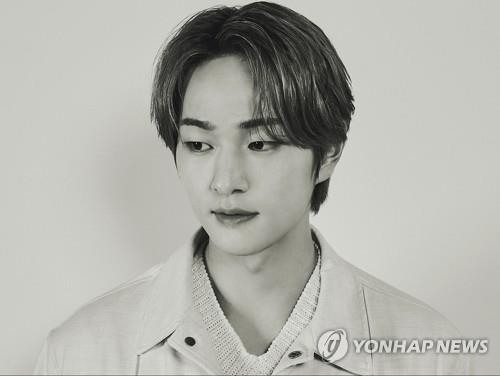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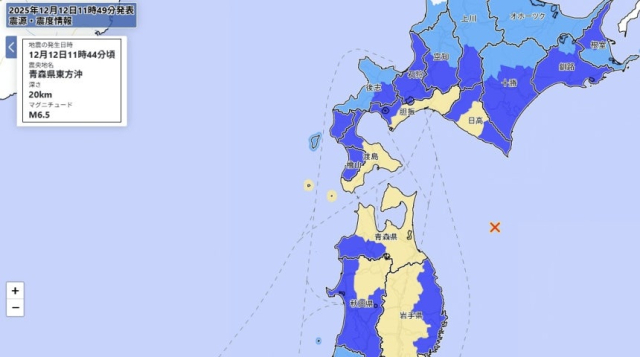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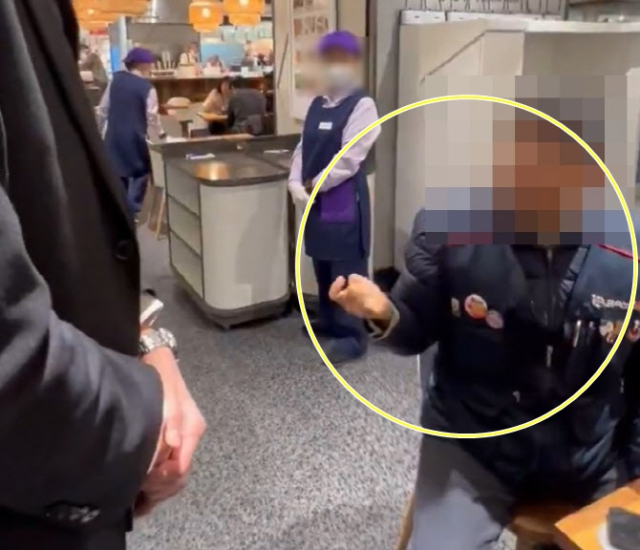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