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문화적으로 가꾸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도시 개발에 있어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특색 있는 도시로 꾸미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그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전국적으로 400개를 넘겼다. 크고 작은 문화 행사야 집계조차 어렵다. 따지고 보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 같은 축제나 문화 행사 러시는 문화를 도시 마케팅과 접목시키려는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를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어쨌건 우리 사회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흐름은 반가운 일이다.
최근 일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강조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어디라 할 것 없이 획일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박제된 도시가 상징이 됐다. 대구만 하더라도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을 밀어붙이고 호수를 메우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권장할 만한 일이었고 넘치는 차량을 위해 오수로 뒤덮인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는 것은 마을마다 숙원사업이었다. 그 결과 푸른 자연은 사라지고 그 공간엔 어김없이 콘크리트 더미가 빼곡히 들어서 도시다운 아름다움을 잃었다. 달서천, 대명천, 범어천 등 도심을 가로지르던 하천은 1967년부터 복개되기 시작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이름만 남아 있다. 지금도 이런 작업들은 도시 한쪽에서 진행 중이다.
이 시기 문화란 일부 소수 계층만이 누릴 수 있던 호사로 여겨졌다. 문화는 고상하고 지적이며 소수를 위한 전유물처럼 취급됐다. 그 한 예로 선진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문화와 관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해석됐다. 문화와 예술은 그저 감상의 대상이었고 문화에 대한 투자는 경제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관광은 쇼핑이나 환락, 그저 먹고 마시는 놀이 정도로 인식돼 왔다. 결과적으로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한계를 가진 채 제 갈 길을 걸은 셈이다. 문화가 관광을 견인하고 지역민들의 정체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최근 도시들의 문화에로의 회귀 움직임은 그래서 반갑다.
반면 유럽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문화를 통한 도시 마케팅에 눈떴다. 문화유산이나 축제를 통해 세계의 유명인들을 불러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해 정신적, 물질적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챙겼다. 문화 예술과 관광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가장 강력한 성장산업 중 하나가 됐다.
지금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올해로 57회째다. 올해만 하더라도 110개 국 1만2천여 출판사가 참여하는 출판 저작권 시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전이다. 명실상부 '문화 올림픽'으로 불릴 만하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를 주빈국으로 초청해 우리도 관심이 많다. 21세기에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구촌 문화 교류의 대명사로서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독일만 하더라도 51년에 시작된 베를린 영화제가 있고 뮌헨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세계적인 맥주 축제가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를 통한 도시 마케팅에 눈뜬 프랑스에서는 아비뇽 연극 축제를 비롯해 칸영화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제가 예술작품과 맞물려 늘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국내적으로는 16년의 세월을 보낸 춘천의 마임 축제를 비롯해 올해로 10회를 맞은 부산 국제 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고양 세계꽃박람회 등이 이미 전국적인 지역 축제로 발판을 굳혔고 세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역사 및 문화 자원을 갖춘 서울이 최근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는 늦다. 지난 2002년 서울이 '하이 서울'을 도시 브랜드로 내건 후 대구도 올해 초 '컬러풀 대구'를 도시 이미지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구의 '컬러'가 무엇이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오면 대답은 궁색해진다.
정창룡 문화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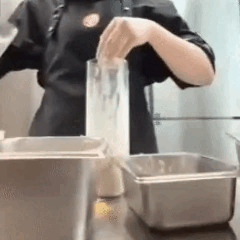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배현진, 故안성기 장례식장 흰 옷 입고 조문…복장·태도 논란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무안공항→김대중공항... "우상화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