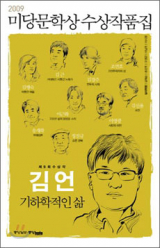
시(詩)는 길고, 현대인들은 약아빠졌다. 문장 하나를 던져주면 그 속에 맛 나고 값어치 있는 무언가 나올 줄 알고, 정신없이 혀로 핥아서 껍질을 벗겨내려한다. 껍질은 녹아 없어졌고, 혀끝에는 허기만 남는다. 그리고는 세치 혀를 놀려대며 "너희가 이 맛을 알아?"라며 잘난 체 한다. 시는 길고, 현대인들은 지쳤다. 시인들은 조급하고 게으르다. 기나긴 시를 쓰는 대신 한 문장씩 던져주면 훨씬 재미날텐데.
'2009 미당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수상작인 김언의 '기하학적인 삶' 외에 시인 9명의 작품이 담겨있다. '우리는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고향에 있는 내 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간다'(기하학적인 삶 중에서), '전쟁 중에는 누구나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랬지/별에 입술을 달아준다면 평화로운 주문들이 골목길에 쏟아지겠지만'(이근화의 '고요한 오렌지 빛' 중에서).
시가 어려운 이유는 분해하려는 속성 때문이고, 시집이 어려운 이유는 풀이집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 가라사대, '풀어헤치면 답이 나오리라'. 평생 그렇게 배워온 현대인에게 풀이집 하나 없이 시를 던져준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러나 아침에 읽은 시 한 편을 하루 종일 껌처럼 찬찬히 씹어제끼는 여유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