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 가는 길은 고갯길이다. 험준한 고갯길 두 곳을 지나야 하는데 바로 노귀재와 삼자현이다. 영천과 청송의 경계에 놓인 노귀재는 약 400년 전 임진왜란을 겪은 뒤 이름이 붙여졌다. 왜병 대부대가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가던 중 이곳에 도착했다. 워낙 험준해서 넘기를 주저하던 차에 한 행인을 만나 이곳 지명을 물었단다. '청송'이라는 답을 듣고는 명나라 원병장이었던 이여송의 '송'(松)과 끝자가 같아 명나라 부대가 주둔할 것으로 지레짐작한 왜병장은 화급히 길을 돌려 딴 곳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우리 강토를 유린한 왜적을 종처럼 취급했고, 그들이 되돌아간 곳이라 해서 '노귀재'라 불렀다. 이 곳에 터널이 만들어진다니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넘던 추억도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다. 청송 현동과 부남을 잇는 고개 삼자현이 기다린다. 산길이 워낙 깊고 음습한 탓에 대낮에도 강도가 출몰했단다. 장터에서 소를 판 돈이며 온갖 짐을 다 빼앗기다보니 며칠을 기다려서라도 세 사람이 모여야 재를 넘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삼자현이다. 잔설이 곳곳에 남아있는 국도를 따라 길을 재촉했다. 주왕산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나서 '푸른 소나무'의 땅, 청송에 닿았다.
출발지를 어디로 정할 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얼마전 내린 폭설 때문이다. 웬만한 도로는 눈 내린 흔적만 남아있을 뿐 깨끗이 치워져 있다. 하지만 산길은 다르다. 아직 사람의 발길 한번 닿지 못해 눈 내린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수두룩하다. '동행' 시리즈를 취재한다며 청송군청을 찾았을 때 담당자들의 난처한 기색이란. 청송으로 떠나기 전에도 일기예보 때문에 수차례 망설였다. 다시 눈이 올 거라며 내내 겁을 주더니 출발 이틀 전에야 '흐림'으로 바뀌었다. 동행한 작가들과의 일정 때문에라도 무작정 출발을 미룰 수 없었다. 군청에서 한참 동안 지도를 펴놓고 답사 구간을 의논한 뒤 당초 일정의 절반 정도만 걸어보기로 했다. 원래 예정했던 길은 얼추 5시간이 걸리는데, 그 코스를 절반으로 뚝 잘라놓고 보니 2시간 남짓이면 걸어볼 수 있다고 했다. 길도 여의치 않았지만, 서쪽으로 향하는 겨울해는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꼬리를 감추기 때문이다. 눈길에 날마저 저물면 큰일이다 싶어 냉큼 그러자고 동의했다. 너무 쉬운 길이 아닐까 싶어 걱정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다. 반 동강 난 답사 코스를 걷는 데만 꼬박 3시간이 걸렸다. 눈길은 결코 얕잡아볼 대상이 아니었다. 괜스레 과욕을 부려 원래 코스를 고집했더라면 한 줄기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길을 오들오들 떨면서 헤맬 뻔 했다.
북풍을 막아주며 청송 읍내를 병풍처럼 둘러친 산이 바로 방광산(518.7m)이다. 읍내 사람들이 운동 삼아 오르는 뒷산이다. 거기서 동북쪽으로 중대산(679.5m)과 태행산(933.1m)이 굽이 도는 능선을 따라 어깨를 감싸안고 늘어서 있다. 청송읍에서 동쪽으로 달기약수탕 쪽으로 방향을 잡아 잠시 달리다보면 약수탕을 지나 월외1리가 나온다. 이 곳이 태행산 MTB(산악자전거) 출발점이다. 원래 여기서 산을 타기 시작해 북쪽으로 태행산 자드락길을 돌아 소나무림 탐방길을 거쳐 중대산을 오른 뒤 방광산 능선을 따라 내려오려고 했다. 매일신문사가 매년 주최하는 '청송산악마라톤' 코스가 바로 이 길이다. 계절 좋은 이른 시각에 출발한다면 놓치기 아까운 코스다. 하지만 발목을 덮을 정도로 하얗게 눈이 쌓인 산길은 보기만 해도 얼굴이 하얗게 질릴 지경이었다. 하늘을 뒤덮은 짙은 먹구름 덕분에 그늘 속에 길꼬리를 감춘 산속 풍경은 더욱 을씨년스럽다.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당초 출발지로 길을 돌렸다.
청송읍내에서 파천면 옹점리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청송 만지송'이 나온다. 중대산에서 내려와 방광산으로 옮겨가는 길목이다. '만지송'은 나이가 800년을 헤아린다. 밑둥치 둘레는 4m 정도이고, 높이 5m부터 만 가지로 온통 갈라진다해서 '만지송'으로 불린다. '푸른 소나무', 즉 청송을 상징하는 나무다. 길 따라 조금 아래쪽에 '방광산 활공장 입구' 표지가 보인다. 이번 '동행' 길의 출발점. 길 안내를 기대했던 청송군청 공보계 이진규씨가 "길에 얽힌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테니 조심해 다녀오라"며 인사를 건넨다.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겨울산 초행길을 '도시 촌사람'끼리 걷게 됐다. 출발부터 심상찮다. 돌이킬 수도 없다. 일단 걷고 보자.
예전 이 길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오솔길이었다. 지금은 산악 마라톤과 MTB 동호인들을 위해 제법 넓직하게 길을 닦았다. 차 한 대도 넉넉히 지나다닐 정도다. 옛 정취는 사라졌지만 솔숲에 둘러쌓인 눈길을 걷는 호젓한 맛은 비할 데가 없다. 어느 옛길인들 사연 없는 곳이 있으랴. 지금 걷는 이 길도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눈물과 땀이 배인 '민초의 길'이었다. 사방 눈 닿는 곳마다 산줄기로 가득 찬 청송. 이웃한 태행산 자락에 살던 월외마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에야 곳곳에서 사과를 재배하지만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길이 막막했다. 월외사람들은 숯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베어 숯을 만든 뒤 청송과 진보는 물론 영덕까지 내다 팔았다. 그 곳에서 사들인 고등어를 등짐에 짊어지고 산길을 달려 청송과 진보까지 내달았고, 행여 생선이 상할까 싶어 소금간을 친 뒤 안동까지 가기도 했다. 삶이 팍팍했던 그 시절, 눈길과 빗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숯길이자 생선길이 된 이 산 속 오솔길을 따라 숱한 사연들도 오갔을 터이다. 시집가는 딸에게 넉넉하지는 못하나마 혼수 하나 장만해주려고 밤길을 달렸을 늙은 아비의 땀이 배어있고, 잔뼈도 굵기 전에 숯 굽는 아버지를 따라 등이 휘도록 짐을 진 채 묵묵히 뒤를 따랐을 얼굴 시커먼 아이의 눈물도 배어있다. 이제는 그 많은 사연들이 길가에 빼곡히 들어선 소나무 가지마다 매달려있다. 바람에, 눈에, 비에 휩쓸려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방광산 능선길은 걷기에 무척 편하다. 잠시 오르막이 있을라치면 이내 평지가 이어지고, 짧은 내리막에 긴장하다가 곧이어 편평한 땅이 근육을 풀어준다. 쭉 뻗은 길이 심심하다 싶으면 이내 굽이치는 오솔길이 숨은 듯 나타난다. 아름드리 금강송을 보면 눈이 시원해진다. 바닥에는 온통 흰 눈이 가득하지만 위로는 금강송 붉은 줄기에 매달린 푸른 솔잎이 계절을 잊게 한다. 능선 아래에서 몰아치는 골바람이 숲을 울게 한다. 그저 '휘이' 몰아치고마는 허전하고 삭막한 바람소리가 아니다. 숲이 우는 소리다. '우웅'하며 깊은 저음으로 울리다가 솔가지끼리 부대끼며 '따닥따닥' 추임새를 넣기도 한다. 거기에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까지 어우러진다. 겨울 산행을 하노라면 자연이 들려주는 박자와 운율에 깜짝 놀라게 된다. '뽀드득 뽀드득 우웅 따닥'. 글을 쓰는 지금도 숲이 우는 소리가 귓전에 가득하다. 굳이 숲이 운다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숲이 노래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많은 눈물의 사연을 담은 길을 떠올리니 그러지 못했다.
길은 외길이고 곳곳에 등산로를 알리는 표지까지 있어 헤맬 염려는 없다. 두 시간 남짓 걷고 나니 이마에 땀도 배이고 숲에 둘러쌓인 길이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다. 그럴 즈음에 방광산 정상 부위가 나타나고,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활공장을 가리키는 표지판도 보인다. 정상부에서 500m쯤 내려가면 활공장이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이 활공장, 왼쪽은 나무계단길이다. 우리는 나무계단길을 택했다. 함께 동행한 작가들은 "와아~"하는 탄성을 쏟아냈다. 청송읍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경쾌한 전망이라니. 잔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산줄기는 그대로가 그림이자 작품이다. 멀리 보이는 능선들은 푸른색에서 회색과 은색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멀어지고, 가까이로는 눈 덮인 청송읍이 눈에 잡힐 듯이 다가선다. 찬바람을 맞으며 그 곳에서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눈길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투덜거렸던 것이 미안해질 지경이다. 청송읍을 가로지르는 용천천이 은색의 향연 속에 굽이치고, 그 아래 학교와 운동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내려오는 계단길은 곳곳에 기막힌 전망을 보여준다. 답삿길을 거꾸로 갔더라면 훨씬 힘들고 재미도 덜했을 것이다. 서서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정상까지 길을 안내한 방광산 능선은 막바지에 이르러 입이 딱 벌어지는 풍광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등산로를 내려서면 청송여중고교 운동장에 닿는다. 출발지에 차를 두었다면 거기서 택시를 타고 '청송 만지송'쪽으로 돌아가면 된다.
글·사진 =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도움말 = 청송군청 공보계 이진규 054)870-6064
전시장소 협찬 = 대백프라자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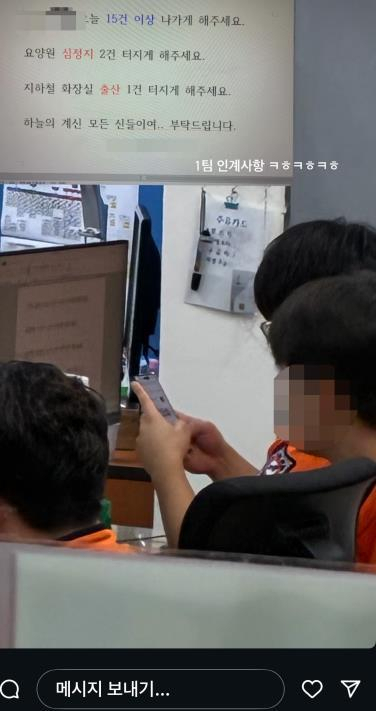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