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서울 살 때 힘들었던 것들 중 하나는 푸른 바다를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가까이서 보면 투명하고 멀리서 보면 넓고 푸른 동해바다. 그 것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이 서울 생활의 고통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여름방학만 되면 천막을 싸들고 동해바다에 가서 일주일씩 살다 왔다. 그러나 의사가 된 뒤 학생 때처럼 그런 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다. 계급이 낮은 의사였으므로 밤과 낮을 구분할 겨를도 없이 바쁜 내 청춘을 흘러 보내고 있었다. 당시 내 일기는 계절도 잊었고 밤낮도 상실되고 없었다.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고 나는 다만 치료하는 하나의 기계 아니 그 기계의 부품이 돼 거대한 대학병원의 한 귀퉁이에서 마치 볼트나 너트처럼 쑤셔 박혀 있었다. 가끔 서해를 가보지만 속만 더 답답해졌다.
나의 동해 바다 사랑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다. 그들은 바다란 해수욕하는 곳, 경치 구경하는 곳 그리고 가서 회를 먹고 오는 곳쯤으로 만 알고 있다. 하긴 그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애정의 차이는 물론 타고 난 취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바다 감상법이 잘 못되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바다 감상법은 좀 어렵다. 비유하자면 고전 음악이나 책을 읽는 것과 흡사하다. 만남의 시작은 아무 재미도 없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밋밋한 맛에 더욱 흥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뎌내노라면 이윽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그 깊은 매력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게 된다.
바다는 햇볕이 쨍쨍한 날 가야 된다. 흐린 날은 전문가가 아니면 바다에서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바다는 다만 검고 붉은 해를 담는다. 해가 솟아오르면 그 때도 아직 바다는 검고 탁한 색깔뿐이지만 햇볕을 반사하는 수많은 은비늘들이 나타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차츰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면 그제야 바다는 제 색깔을 띠게 된다. 처음에는 연한 파란 색이 나타난다. 그리고 진한 파란 색이 되었다가 점점 깊은 남색으로 변한다. 한 낮이 되면 바다는 푸른 계통의 색들의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파란 색. 남색, 검은 남색 그리고 연두에서 초록이 빛까지 온통 청색의 향연이 벌어진다.
바람은 보너스이다 바람 부는 날은 흰 파도가 바다 위를 넘실거려 사람들의 가슴을 설래준다. 먼 바다에서 보이는 너울부터 발아래 해변으로 몰려오는 개구쟁이 파도까지 파도는 푸름에 흰 색을 덧칠하여 그 예술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감상법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종교인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예술가들은 미술이나 시 혹은 소설을, 낭만 객들은 그들의 연인들을 각자가 가슴에 안고 바다를 만나는 것이다. 바다는 설교하고 할을 외치고 교향곡을 연주하며 시화전을 벌린다. 애인의 생령을 만나게 해준다. 프로의 경지는 아니더라도 긴 시간 인내심을 갖고 뚫어지게 바다를 응시하고 그 미세한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으면 여러 분들은 삶의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권영재 대구의료원 신경정신과 과장·서구정신보건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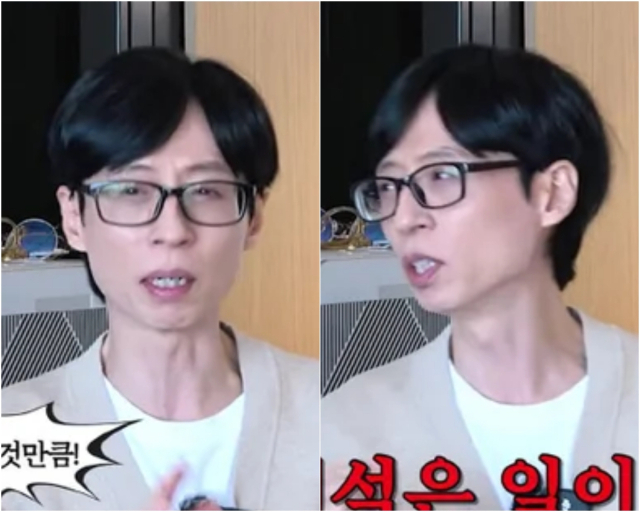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