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달 백수 세 사람이 남도 여행길에 올랐다. 계획도 일정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바닷가를 돌다가 해가 지면 아무 데서나 자고 해가 뜨면 달리는 것이 일정이었다. 우린 다니던 신문사에서 퇴출당한 룸펜이다.
퇴직한 다음날 조간신문에 양복을 입은 샐러리맨이 산길을 걸어가는 사진과 기사가 1면에 실려 있었다. 그도 나와 같은 동업자 신세였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넥타이까지 매고 집을 나서긴 했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 사진을 보고 그가 나인 양 나는 울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괴물이 우리 금수강산에 쳐들어왔을 때 마음 준비, 돈 준비가 없었던 수많은 퇴직자들이 산으로 내몰렸다. 막상 직장을 떠나고 나면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이른 아침부터 다방에 가기도 그렇고 친구 사무실을 찾아가기란 더더욱 어려운 노릇이다. 누구든 싫은 기색 없이 받아주는 산도 마냥 기댈 수는 없다. 퇴직 후 '18번'이 되어 버린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란 유행가 제목이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었다.
30년 넘게 아침마다 달려가던 직장을 잃었으니 마음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 적응과 탄력은 무서운 낱말이다. 이 두 단어는 시간을 요구한다. 쉽게 말하면 노는 데 길들여지려면 상당 기간 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연후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 마음의 의지처를 산에서 바다로 돌리고 뜻을 함께할 도반을 물색했다. 동병상련 환자 둘을 영입하여 이렇게 길을 나선 것이다.
차에 버너와 코펠을 싣고 남해 쪽으로 내달렸다. 통영'삼천포'여수를 지나 고흥'강진'해남을 거쳐 완도에서 노화도로 들어갔다. 도로를 달리다가 배가 차를 태워주면 배를 탔고 땅거미가 끼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갇혀 소주를 마셨다. 피부의 헌 데에는 '아까찡'(머큐로크롬)이 잘 듣지만 영혼의 상처에는 투명한 소주가 명약이다.
진도까지 오는 데 2박 3일이 걸렸다. 백수에게 시간은 돈이 아니라 애물단지다. 여수 오동도에서 갓김치를 먹고 노화도에서 생선회를 먹으며 해조음을 들었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즐거움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풍경이나 음식에 있지 않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진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글과 책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 그는 진도군청 앞에서 개업한 외과의사다. "여행 중에 지금 진도를 지나가고 있어요"하고 안부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만나고 가란다. 때는 해거름, 석양주 한잔 마실 딱 좋은 시간이다. 약속 장소인 스타호텔 뒤 귀빈각 한정식으로 들어서니 친구는 어릴 적 친구처럼 뛰어나와 반겨주었다.
진도 명물 홍주를 곁들인 전라도 음식이 정갈스럽게 한상 차려져 나왔다. 신선로와 육회도 있었지만 홍어 외엔 다른 게 보이지 않았다. 정확하게 30분이 채 걸리지 않아 홍어접시만 비어 버렸다. "경상도 사람들이 우째 홍어를 그래 좋아한다요. 허허. 한 접시 더 헙시다." "좀 더 익은 걸로 줘요. 애는 없어요." 주인 마담은 경상도 사람들이 홍어를 잘 먹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지 "다음에 오시면 홍어코를 준비할게요"한다.
그날 밤 우린 홍주와 홍어에 취해 모두 홍안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지만 예약한 방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진도를 떠나면서 딱 한마디 "홍어코 준비할게요"란 말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진도를 다녀온 후 어쩌다 홍어 전문집에 갈 때마다 홍어코의 안부를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도 먹어 본 사람도 없었다.
중국 천주산 트레킹을 다녀온 도반들이 "먼 데서 홍어 상자가 택배로 왔으니 빨리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소담스레 담긴 홍어 세트에 회는 물론 코와 애까지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남도의 마니아들도 숙성도가 가장 강한 홍어코를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며 먹을까 말까 망설인다고 한다. 홍어코의 강도는 생각보다 강했지만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했다. 홍어코는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고 가스와 냄새만 눈과 코로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푸와하!"
수필가 9hwal@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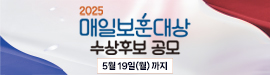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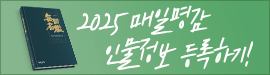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