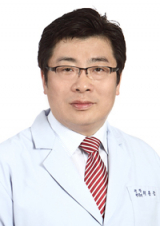
지난달 11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이름도 낯선 '준법지원인' 제도가 사실상 도입됐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상시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도록 준법지원인을 두는 규정이다.
대기업의 변칙상속이나 배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준법경영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이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이 말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권 남용이란 지적까지 받으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변호사업계는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이 같은 지적에 펄쩍 뛰면서 기업들이 당장에 산술적인 비용부담만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변호사업계는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4배가 넘는다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쏙 빼놓은 것이다. 최근 들어 재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기업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어이 도입된 데는 로스쿨 졸업생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선뜻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다. 변호사협회는 어떻게든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수를 늘려서 중소기업들도 싼 비용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썼어야 한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기업부담을 고려해 제도적용을 대기업에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인지 거듭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최중근(탑정형외과연합의원 원장)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